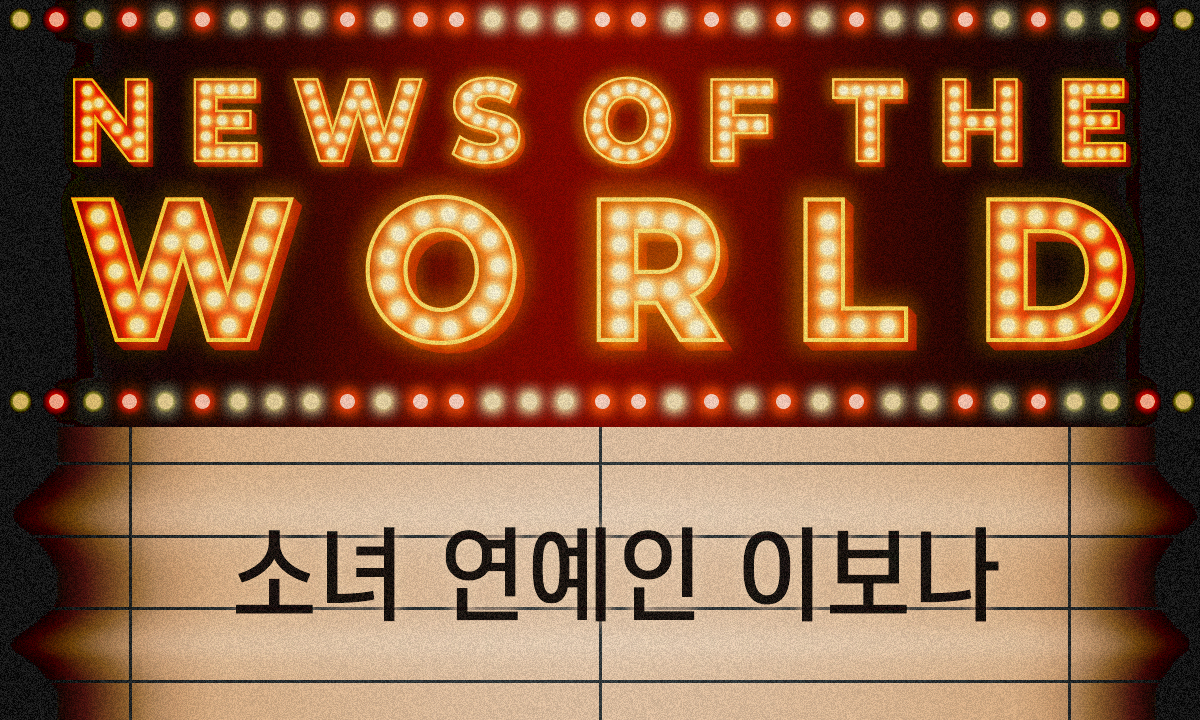
NoW
[NoW] “Lee Bona: Girl Celebrity” by Han Jeonghyeon
Queering East Asian cultural history
2021.01.08
*Sorry, but this article is only available in Korean.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잊혀진 여성의 역사를 발굴하여 대항 담론으로서의 ‘허스토리’를 쓰는 일은 주로 ‘친족 서사’를 통해 재구성된다. 위대한 예술가 아들을 길러낸 어머니, 남편의 독립운동을 뒷바라지한 아내, 집안의 자원을 집중 투자받은 오라비를 조력했던 누이들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일만으로도 여성의 이야기가 너끈히 발명되어 왔다. 김명순과 박경리와 박완서가 안내했던 그 길목들에서 후대는 여성의 역사를 알아왔다.
하지만 가족사만이 여성사의 전부일 순 없을 것이다. 제국주의와 전쟁, 독재와 냉전 등을 두루 거치며 이주하고 이산했던 동아시아 시민 중에는 분명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1980년대생 소설가 한정현은 여성의 역사를 쓰는 일을 시작하며 ‘족보’를 들여다보는 대신 ‘대중문화’를 본다. 할당받은 자리는 정상 가족 내 성 역할이었지만, 꿈꿨던 자리는 가족 바깥의 무대였던 이들, ‘소녀 연예인 이보나’의 주인공들은 위업을 남긴 누군가의 ‘여성 친족’이 아니라 그 자신으로 살고자 했던 ‘여성 예술가’들이다.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이 ‘젠더 벤딩’을 상상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는 오늘날의 현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아시아 문화사에 내재되어 있던 기획이다. 이 소설에 나오는 한ㆍ중ㆍ일 여성들이 섞여 조직된 다국적 소녀 가극단과 남장을 한 소녀 배우들은 작금의 동아시아 문화의 중요한 계보다. 작가는 무당과 가수, 배우와 작가, 영화감독 그리고 이 예성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지했던 수많은 팬들과 후대 연구자들을 내세워 거대 문화 산업 성립의 주체로서 여성의 자리를 세운다. 남성-이성애자-시스젠더-내지인-엘리트 중심의 역사는 퀴어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아시아 대중문화를 경유하며 다시 쓰인다.
하위 주체들이 감당해왔던 하중의 위압감만큼 그들이 선망했던 판타지의 형상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일, 수난과 착복이 반복된 삶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던 행위와 연대가 있었음을 발견하는 일, 냉소는 쉽지만 낙관은 어려운 여성들이 이 책이 제시하는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래된 지혜란 그런 것이다.
잊혀진 여성의 역사를 발굴하여 대항 담론으로서의 ‘허스토리’를 쓰는 일은 주로 ‘친족 서사’를 통해 재구성된다. 위대한 예술가 아들을 길러낸 어머니, 남편의 독립운동을 뒷바라지한 아내, 집안의 자원을 집중 투자받은 오라비를 조력했던 누이들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일만으로도 여성의 이야기가 너끈히 발명되어 왔다. 김명순과 박경리와 박완서가 안내했던 그 길목들에서 후대는 여성의 역사를 알아왔다.
하지만 가족사만이 여성사의 전부일 순 없을 것이다. 제국주의와 전쟁, 독재와 냉전 등을 두루 거치며 이주하고 이산했던 동아시아 시민 중에는 분명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1980년대생 소설가 한정현은 여성의 역사를 쓰는 일을 시작하며 ‘족보’를 들여다보는 대신 ‘대중문화’를 본다. 할당받은 자리는 정상 가족 내 성 역할이었지만, 꿈꿨던 자리는 가족 바깥의 무대였던 이들, ‘소녀 연예인 이보나’의 주인공들은 위업을 남긴 누군가의 ‘여성 친족’이 아니라 그 자신으로 살고자 했던 ‘여성 예술가’들이다.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이 ‘젠더 벤딩’을 상상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는 오늘날의 현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아시아 문화사에 내재되어 있던 기획이다. 이 소설에 나오는 한ㆍ중ㆍ일 여성들이 섞여 조직된 다국적 소녀 가극단과 남장을 한 소녀 배우들은 작금의 동아시아 문화의 중요한 계보다. 작가는 무당과 가수, 배우와 작가, 영화감독 그리고 이 예성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지했던 수많은 팬들과 후대 연구자들을 내세워 거대 문화 산업 성립의 주체로서 여성의 자리를 세운다. 남성-이성애자-시스젠더-내지인-엘리트 중심의 역사는 퀴어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아시아 대중문화를 경유하며 다시 쓰인다.
하위 주체들이 감당해왔던 하중의 위압감만큼 그들이 선망했던 판타지의 형상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일, 수난과 착복이 반복된 삶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던 행위와 연대가 있었음을 발견하는 일, 냉소는 쉽지만 낙관은 어려운 여성들이 이 책이 제시하는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래된 지혜란 그런 것이다.
TRIVIA
다카라즈카 여성 가극단
1913년 일본 효고현에서 시작된 극단으로 전원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성 배우가 남성 역할과 여성 역할을 모두 맡고 성별에 따른 행위가 형식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성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기’와 ‘인정’이라는 수행 절차를 통해 구성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무대가 되기도 한다.
다카라즈카 여성 가극단
1913년 일본 효고현에서 시작된 극단으로 전원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성 배우가 남성 역할과 여성 역할을 모두 맡고 성별에 따른 행위가 형식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성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기’와 ‘인정’이라는 수행 절차를 통해 구성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무대가 되기도 한다.
Article. 오은교(문학평론가)
Design. 전유림
Copyright © Weverse Magazine. All rights reserved.
Unauthorized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hibited.
Unauthorized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hibited.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