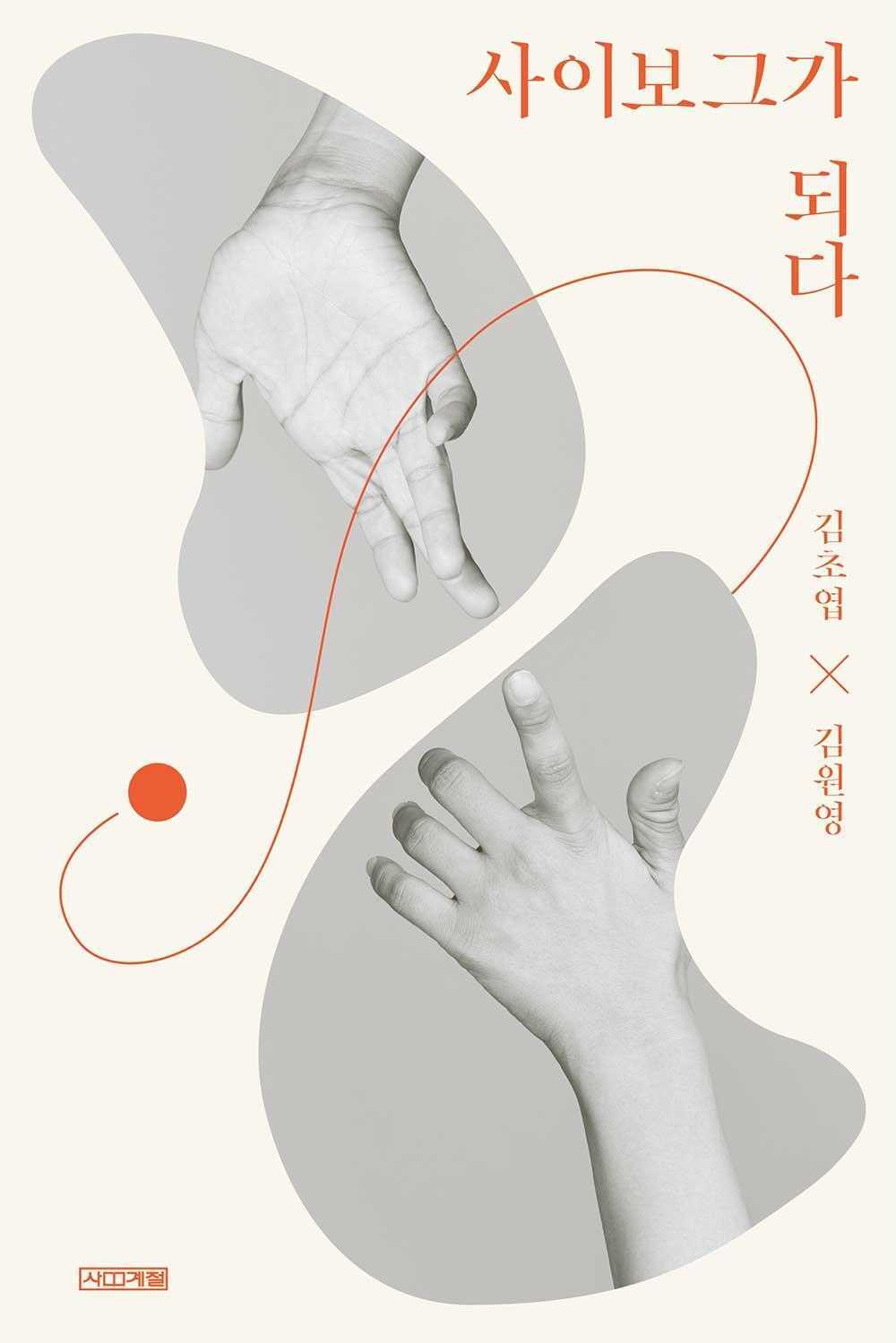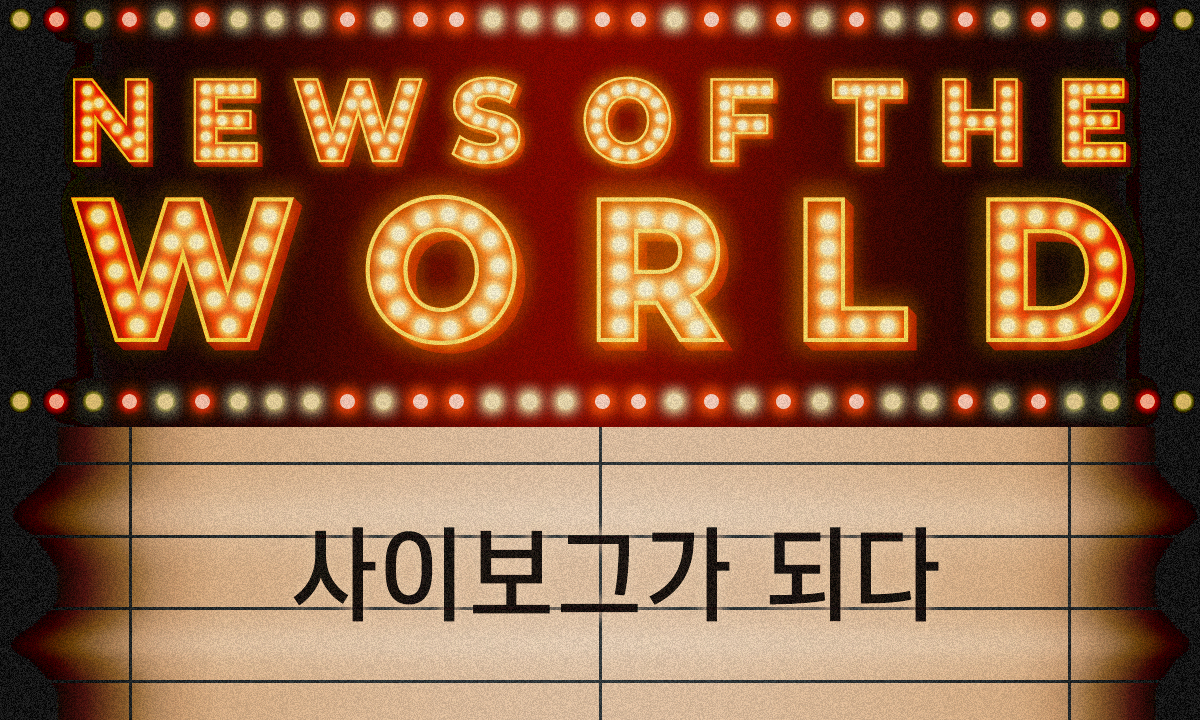
NoW
[NoW] ‘사이보그가 되다’
심리스한 세계와 수선하는 사이보그들
2021.02.05
‘사이보그’의 보편적 시각 이미지는 표면이 맨들맨들하며 절단면과 이음새가 버성김 없이 맞물려 있는 ‘매끄럽고 통합적인 미래적 존재’다. 합리적인 계산법에 따라 작동되는 모션은 다소 기계적이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유연해질 것이며 타 유기체와의 결합 싱크로율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초엽과 김원영의 공저 ‘사이보그가 되다’는 이 매끄럽고, 미래적이며, 연합적인 사이보그의 이미지를 껄끄럽고, 현재적이며, 고유한 경험을 가진 장애인의 존재 방식과 겹쳐 사유할 것을 요청한다.
보조 기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은 사이보그적 생활양식이 그다지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기계는 비싸고 조작법이 까다로울뿐더러 염증을 일으키고, 고장이 잦으며, 방전되면 무용하다는 점에서 전혀 심리스(seamless)하지 않다. 운영체제 통합 기술과 디자인 개선을 통해 점차 사유와 행동의 봉제선을 느끼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이 심리스한 세계에서 끊임없이 덜컹거리는 틈새를 가시화하고, 이를 수선하는 장애인 사이보그의 존재는 모듈 간의 차이를 무화하는 첨단 용접 기술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발견하는 역능을 가진 존재들이다.
두 저자는 ‘손상된 자’로 취급되는 장애인이 기술 자본의 ‘수혜’를 통해 인간의 표준적 능력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테크노에이블리즘(Technoablism, 기술이 장애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 서사를 경계하며 ‘치료받지 않을 자유’를 논하는 동시에 기능 강화와 심미적 향상 등이 포함된 장애인의 ‘신체 디자인에 대한 욕망’을 폐기하지 않은 채 트랜스휴먼에 대한 상상력으로 나아간다.
‘투박한 의수’를 착용한 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운전과 사격 솜씨를 보이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퓨리오사는 결함을 극복한 ‘슈퍼 장애인’처럼 보이지만, ‘잘빠진 슈트’를 입으면 세계 최강자가 되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화적 존재로 인식되는 것은 이들의 젠더적, 계급적 차이와 더불어 ‘치료’와 ‘증강’ 기술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상이하게 작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치료는 언제나 감동적이지만, 증강은 어딘지 비윤리적으로 느껴진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퓨리오사만 조종할 수 있는 자동차는 증강 기술의 산물이 아닌가. 토니 스타크는 왜 그렇게 인간적 매력을 어필하는가.
김초엽의 소설 ‘로라’는 몸의 일부를 연장하거나 절단하는 사람들을 다룬다. 소설 속에서 이들은 장애를 낭만화하고 육체를 페티시화했다는 비난에 직면하지만, 이야기는 개개인의 고유한 신체 감각과 욕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소설 속 화자 ‘나’는 원래의 몸과 잘 붙지 않아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는, 차갑고 단단하고 기름 냄새가 나는 세 번째 팔로 자신을 포옹해주는 연인의 품 안에서 생각한다. “사랑하지만 끝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신에게도 있지 않나요.”
보조 기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은 사이보그적 생활양식이 그다지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기계는 비싸고 조작법이 까다로울뿐더러 염증을 일으키고, 고장이 잦으며, 방전되면 무용하다는 점에서 전혀 심리스(seamless)하지 않다. 운영체제 통합 기술과 디자인 개선을 통해 점차 사유와 행동의 봉제선을 느끼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이 심리스한 세계에서 끊임없이 덜컹거리는 틈새를 가시화하고, 이를 수선하는 장애인 사이보그의 존재는 모듈 간의 차이를 무화하는 첨단 용접 기술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발견하는 역능을 가진 존재들이다.
두 저자는 ‘손상된 자’로 취급되는 장애인이 기술 자본의 ‘수혜’를 통해 인간의 표준적 능력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테크노에이블리즘(Technoablism, 기술이 장애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 서사를 경계하며 ‘치료받지 않을 자유’를 논하는 동시에 기능 강화와 심미적 향상 등이 포함된 장애인의 ‘신체 디자인에 대한 욕망’을 폐기하지 않은 채 트랜스휴먼에 대한 상상력으로 나아간다.
‘투박한 의수’를 착용한 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운전과 사격 솜씨를 보이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퓨리오사는 결함을 극복한 ‘슈퍼 장애인’처럼 보이지만, ‘잘빠진 슈트’를 입으면 세계 최강자가 되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화적 존재로 인식되는 것은 이들의 젠더적, 계급적 차이와 더불어 ‘치료’와 ‘증강’ 기술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상이하게 작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치료는 언제나 감동적이지만, 증강은 어딘지 비윤리적으로 느껴진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퓨리오사만 조종할 수 있는 자동차는 증강 기술의 산물이 아닌가. 토니 스타크는 왜 그렇게 인간적 매력을 어필하는가.
김초엽의 소설 ‘로라’는 몸의 일부를 연장하거나 절단하는 사람들을 다룬다. 소설 속에서 이들은 장애를 낭만화하고 육체를 페티시화했다는 비난에 직면하지만, 이야기는 개개인의 고유한 신체 감각과 욕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소설 속 화자 ‘나’는 원래의 몸과 잘 붙지 않아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는, 차갑고 단단하고 기름 냄새가 나는 세 번째 팔로 자신을 포옹해주는 연인의 품 안에서 생각한다. “사랑하지만 끝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신에게도 있지 않나요.”
TRIVIA
반려종 선언(The Companion Species Manifesto)
1985년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자연’과 ‘인공’의 이분법을 통해 전개되는 성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 기기 등의 인공 장치와 연결된 여성으로서의 사이보그 존재성을 선언했다. 2003년 해러웨이는 이를 확대하여 인간과 비인간, 생물과 미생물을 모두 아우르는 모든 종(Species)간의 연립 네트워크를 상상하는 ‘반려종’으로서의 존재론을 선언했다.
반려종 선언(The Companion Species Manifesto)
1985년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자연’과 ‘인공’의 이분법을 통해 전개되는 성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 기기 등의 인공 장치와 연결된 여성으로서의 사이보그 존재성을 선언했다. 2003년 해러웨이는 이를 확대하여 인간과 비인간, 생물과 미생물을 모두 아우르는 모든 종(Species)간의 연립 네트워크를 상상하는 ‘반려종’으로서의 존재론을 선언했다.
글. 오은교(문학평론가)
디자인. 전유림
Copyright © Weverse Magazine.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