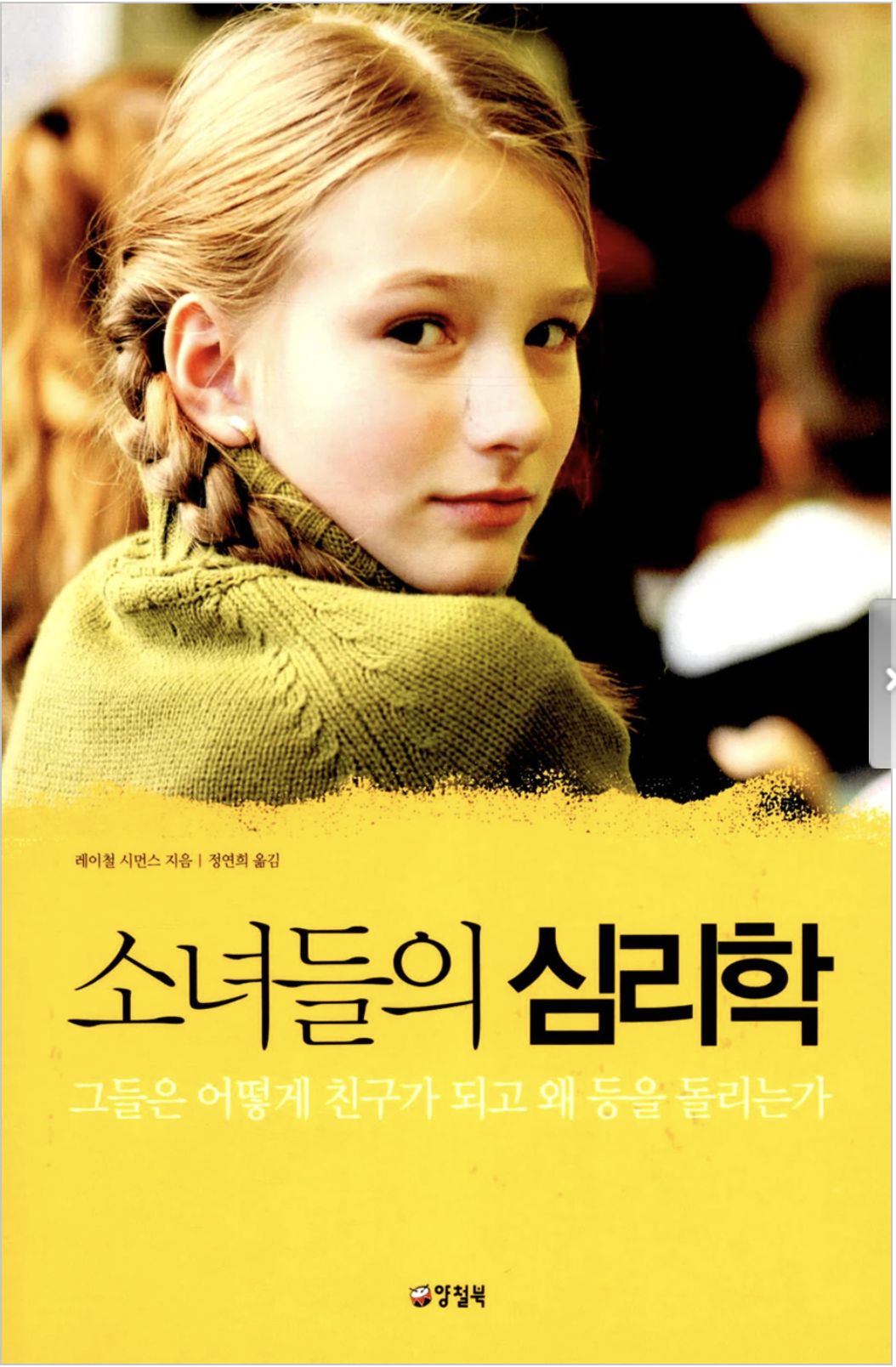NoW
[NoW] 소녀들의 싸움 기술
레이첼 시먼스의 ‘소녀들의 심리학’
2021.03.12
여성들 간의 공격 문화는 좀처럼 가시적이지가 않다. 친구들과 치고 박고 싸우며 크는 것이 성장을 위한, 당연하고도 건강한 수순인 것처럼 논의되는 소년들과 달리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입받는 소녀들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하게 된다. 이들의 상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다.
소녀들 간의 보이지 않는 공격 문화에 대해 연구한 레이첼 시먼스는 잘 드러나지 않기에 진지한 연구 대상으로 취급되지 못하는 10대 여성들의 공격 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여성들은 화내지 않고, 승부욕을 감추고, 언제나 배려해야 하는 상냥한 소녀가 될 것을 요구받기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하는 것을 수치스러워 하게 된다. 겸손과 절제가 여성성의 핵심이기에 그 어떤 말보다 ‘나댄다’라는 평가가 소녀들을 상처 입히는 가장 치명적인 말이 된다.
대놓고 싸우지 않아야 하는 소녀들은 비신체적인 형태, 간접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공격한다. 싸늘한 눈빛, 수근거림, 무시, 조롱 섞인 농담의 표적이 되는 것, 나를 건너뛰고 일어나는 쪽지 건네기와 SNS 댓글 달기가 그 같은 ‘대체 공격’의 예시로, 이러한 또래 문화 속에서 소녀들은 과민하게 눈치를 보고 표면 너머의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은밀한 공격은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도 여성들에게 특화된 방식이다.
미래에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받는 여성은 서로를 돌보는 방식으로 우정을 쌓고, 여성의 사회적 자원이 바로 이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소한 갈등이 관계 전체를 망쳐버릴 것이라는 불안이 소녀를 압도하며 이는 손쉽게 자책의 늪으로 이어진다. 집단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 학대를 애정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여성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걸 파워’ 시대라지만, 소녀가 스스로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일을 은연중에 악마화하는 사회에서 그것은 덧없는 구호일 뿐이다. 대중 서사 속에서 소녀들의 갈등 문화는 ‘여우 같은’ 여성들이 벌이는 ‘얌체짓’으로 표현되지만, 시먼스는 이 바로 그 재현 방식 자체가 소녀들을 억압하는 기제임을 재차 상기시킨다. 청소년 시기의 폭력과 따돌림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가시적인 폭력에 대한 증거주의만으로는 10대 여성들의 경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여성들이 겪으며 성장하는 문제지만, 아직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는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
소녀들 간의 보이지 않는 공격 문화에 대해 연구한 레이첼 시먼스는 잘 드러나지 않기에 진지한 연구 대상으로 취급되지 못하는 10대 여성들의 공격 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여성들은 화내지 않고, 승부욕을 감추고, 언제나 배려해야 하는 상냥한 소녀가 될 것을 요구받기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하는 것을 수치스러워 하게 된다. 겸손과 절제가 여성성의 핵심이기에 그 어떤 말보다 ‘나댄다’라는 평가가 소녀들을 상처 입히는 가장 치명적인 말이 된다.
대놓고 싸우지 않아야 하는 소녀들은 비신체적인 형태, 간접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공격한다. 싸늘한 눈빛, 수근거림, 무시, 조롱 섞인 농담의 표적이 되는 것, 나를 건너뛰고 일어나는 쪽지 건네기와 SNS 댓글 달기가 그 같은 ‘대체 공격’의 예시로, 이러한 또래 문화 속에서 소녀들은 과민하게 눈치를 보고 표면 너머의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은밀한 공격은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도 여성들에게 특화된 방식이다.
미래에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받는 여성은 서로를 돌보는 방식으로 우정을 쌓고, 여성의 사회적 자원이 바로 이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소한 갈등이 관계 전체를 망쳐버릴 것이라는 불안이 소녀를 압도하며 이는 손쉽게 자책의 늪으로 이어진다. 집단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 학대를 애정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여성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걸 파워’ 시대라지만, 소녀가 스스로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일을 은연중에 악마화하는 사회에서 그것은 덧없는 구호일 뿐이다. 대중 서사 속에서 소녀들의 갈등 문화는 ‘여우 같은’ 여성들이 벌이는 ‘얌체짓’으로 표현되지만, 시먼스는 이 바로 그 재현 방식 자체가 소녀들을 억압하는 기제임을 재차 상기시킨다. 청소년 시기의 폭력과 따돌림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가시적인 폭력에 대한 증거주의만으로는 10대 여성들의 경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여성들이 겪으며 성장하는 문제지만, 아직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는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
TRIVIA
자기 자비(Self-compassion)
레이첼 시먼스는 후속작 ‘소녀는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통해 소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비’의 기술이라고 말한다. 그는 날씬하고 착한 소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내면화된 수치심,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 등을 통해 스스로를 비난하는 버릇이 천성이 되어버린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 성립되는 ‘자존감(Self-esteem)’ 대신, 평가를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며 동일한 경험을 무수한 사람들이 비슷하게 겪고 있음을 상기하는 ‘자기 자비’의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자기 자비(Self-compassion)
레이첼 시먼스는 후속작 ‘소녀는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통해 소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비’의 기술이라고 말한다. 그는 날씬하고 착한 소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내면화된 수치심,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 등을 통해 스스로를 비난하는 버릇이 천성이 되어버린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 성립되는 ‘자존감(Self-esteem)’ 대신, 평가를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며 동일한 경험을 무수한 사람들이 비슷하게 겪고 있음을 상기하는 ‘자기 자비’의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글. 오은교(문학평론가)
디자인. 전유림
Copyright © Weverse Magazine.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