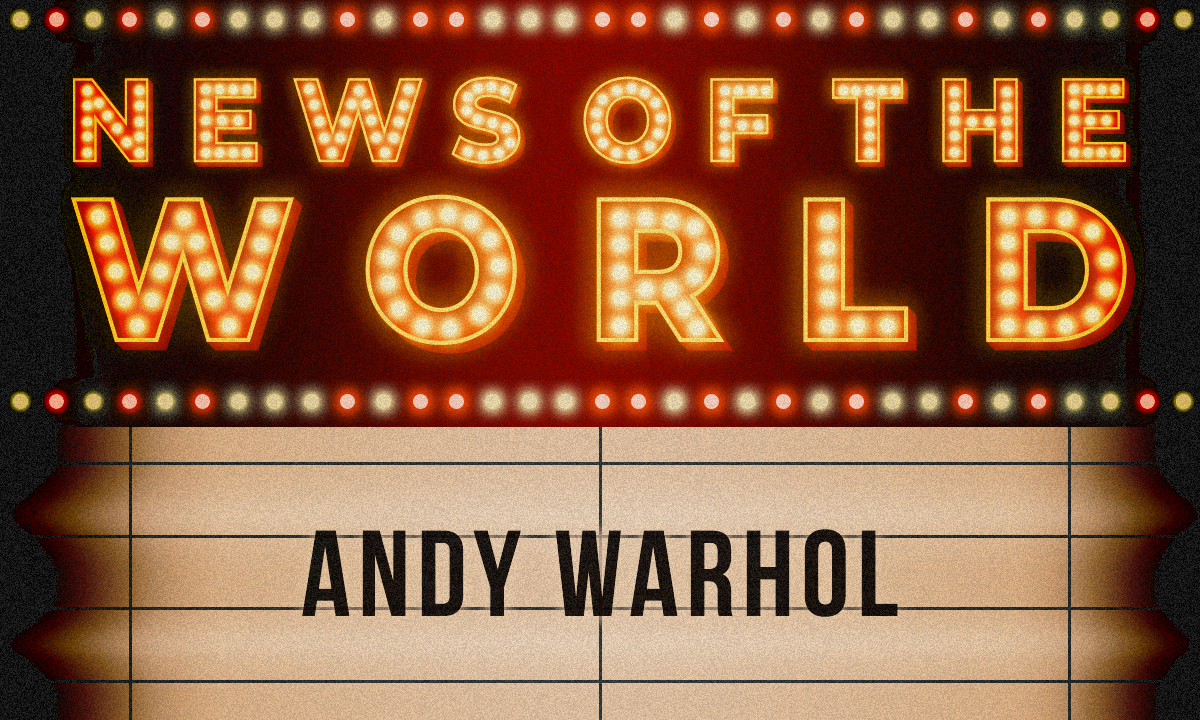
NoW
[NoW] 앤디 워홀에게 가는 파티장
ANDY WARHOL : BEGINNING SEOUL 전시
2021.04.09
시대를 통찰한 예술가들은 시간을 넘어서는 아이콘으로 남아,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탈리아의 주요 미술관 투어를 마치고, 지난 2월 26일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앤디 워홀의 대규모 회고전 'ANDY WARHOL : BEGINNING SEOUL'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시대를 이어주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 우리에겐 팝아트의 거장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앤디 워홀은 “예술은 당신이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일상에서의 경험과 예술의 대중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1900년대 중반부터 명성을 얻기 시작한 그의 활동으로 인해, 당시의 미술계는 전통적 예술의 권위로부터 극단적 반전을 마주하게 되었다. 과거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작가의 손길이 앤디 워홀의 작업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대량생산과 소비를 추구한 당시의 시대상을 투영한 그의 대표작들은,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상의 이미지들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찍어낸 결과물이기에 작가의 손길은 의도적으로 제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방식과 큰 차이를 보였던, 작품에 대한 앤디 워홀의 접근 방식엔 성공한 상업미술가로서 활동한 경력이 크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 시절부터 유명세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던 워홀의 첫 시작은 디자이너였다. 활발한 활동으로 ‘보그’, ‘글래머’, 티파니 등 유명 브랜드와 일을 하며 최고의 상업미술가로 성공을 거두자, 그는 순수예술가로서의 명성을 추구하며 작업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렇기에 그의 작품에서 선택된 이미지와 제작 방식의 차별화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할리우드 스타, 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용품들의 캔이나 포장지, 콜라병, 지폐 등의 일상적인 소재들은 워홀에게 차용되어 사회를 바라보는 예술로 변화되었다. 의식하지 않고 생활하는 일상과 그것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도 다른 문제이다. 작품 안에서 보여지는 대상들은 단순히 현실의 제품이나 사람 그 자체를 기록하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대중적 대상을 선택하여 보여줌으로써 그 시대와 사회의 총체적 풍경을 이야기하려 했던 것이다. 그의 작업으로 가속화된 패러다임의 변화는 수많은 예술철학적 논의를 낳았으며, 당시 미국의 평론가 아서 단토는 과거의 전통적 권위에 사로잡힌 예술의 종말을 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 예술과 그것을 수용하는 관점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현대의 우리들은 처음 본 이미지 혹은 새로운 형식의 작품들을 경험하더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앤디 워홀이 보여주고자 하였던 예술에 대한 시점을 충분히 체감하며 이번 전시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장 입구를 사이에 두고 외부와 완전히 달라지는 풍경은 나지막이 들려오는 음악과 어우러져 파티장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준다. 일상적으로 파티를 주최했던 앤디 워홀의 팩토리가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대목이다. 주제와 형식에 따라 6개의 섹션으로 나뉜 전시장은 작품들의 강렬한 색채와 조명의 강한 대조로, 관람객들이 앤디 워홀 전시에서 기대하는 팝아트를 집중도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다. 기존에 많이 노출되었던 실크스크린 평면 작업들뿐만 아니라 오브제, 드로잉 등 여러 작품들로 구성되어 앤디 워홀의 작업에 대해 폭넓은 경험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작품과 포토 존이 혼재되어, 앤디 워홀의 세계를 각자의 기억과 사진으로 남겨갈 여지는, 단순히 작품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이곳에서 무엇을 경험했는가에 대해 추억하게 될 것이다. 변하지 않는 사진의 순간성과 영원성을 극찬한 앤디 워홀의 이야기처럼, 사진은 이곳을 찾았던 관람객들이 사진 속 주인공이 된 순간을 일상으로 남겨준다. 시간이 지나 우리가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때엔 우리도 자연스레 일상에서 벗어났던 미적 체험을, 일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앤디 워홀이 그랬듯이.
어린 시절부터 유명세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던 워홀의 첫 시작은 디자이너였다. 활발한 활동으로 ‘보그’, ‘글래머’, 티파니 등 유명 브랜드와 일을 하며 최고의 상업미술가로 성공을 거두자, 그는 순수예술가로서의 명성을 추구하며 작업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렇기에 그의 작품에서 선택된 이미지와 제작 방식의 차별화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할리우드 스타, 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용품들의 캔이나 포장지, 콜라병, 지폐 등의 일상적인 소재들은 워홀에게 차용되어 사회를 바라보는 예술로 변화되었다. 의식하지 않고 생활하는 일상과 그것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도 다른 문제이다. 작품 안에서 보여지는 대상들은 단순히 현실의 제품이나 사람 그 자체를 기록하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대중적 대상을 선택하여 보여줌으로써 그 시대와 사회의 총체적 풍경을 이야기하려 했던 것이다. 그의 작업으로 가속화된 패러다임의 변화는 수많은 예술철학적 논의를 낳았으며, 당시 미국의 평론가 아서 단토는 과거의 전통적 권위에 사로잡힌 예술의 종말을 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 예술과 그것을 수용하는 관점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현대의 우리들은 처음 본 이미지 혹은 새로운 형식의 작품들을 경험하더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앤디 워홀이 보여주고자 하였던 예술에 대한 시점을 충분히 체감하며 이번 전시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장 입구를 사이에 두고 외부와 완전히 달라지는 풍경은 나지막이 들려오는 음악과 어우러져 파티장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준다. 일상적으로 파티를 주최했던 앤디 워홀의 팩토리가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대목이다. 주제와 형식에 따라 6개의 섹션으로 나뉜 전시장은 작품들의 강렬한 색채와 조명의 강한 대조로, 관람객들이 앤디 워홀 전시에서 기대하는 팝아트를 집중도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다. 기존에 많이 노출되었던 실크스크린 평면 작업들뿐만 아니라 오브제, 드로잉 등 여러 작품들로 구성되어 앤디 워홀의 작업에 대해 폭넓은 경험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작품과 포토 존이 혼재되어, 앤디 워홀의 세계를 각자의 기억과 사진으로 남겨갈 여지는, 단순히 작품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이곳에서 무엇을 경험했는가에 대해 추억하게 될 것이다. 변하지 않는 사진의 순간성과 영원성을 극찬한 앤디 워홀의 이야기처럼, 사진은 이곳을 찾았던 관람객들이 사진 속 주인공이 된 순간을 일상으로 남겨준다. 시간이 지나 우리가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때엔 우리도 자연스레 일상에서 벗어났던 미적 체험을, 일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앤디 워홀이 그랬듯이.
-
 © Lee Jangro
© Lee Jangro
TRIVIA
POP ART
팝아트(Pop Art)라는 용어는 대중 예술(Popular Art)을 뜻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의 평론가 로렌스 엘러웨이(Lawrence Alloway)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술사에서는 주로 20세기 중반에 나타난 영국과 미국에서 나타난 경향을 가리키며, 당시의 시대상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미술이었다. 영국과 미국의 팝아트는 약간의 시기적 차이와 접근하는 작가들의 관점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미디어와 광고 등 대중문화적 시각 이미지를 순수 미술에 차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통적 예술의 유미주의와 대중문화의 거리를 좁힌 것으로 이야기된다.
POP ART
팝아트(Pop Art)라는 용어는 대중 예술(Popular Art)을 뜻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의 평론가 로렌스 엘러웨이(Lawrence Alloway)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술사에서는 주로 20세기 중반에 나타난 영국과 미국에서 나타난 경향을 가리키며, 당시의 시대상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미술이었다. 영국과 미국의 팝아트는 약간의 시기적 차이와 접근하는 작가들의 관점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미디어와 광고 등 대중문화적 시각 이미지를 순수 미술에 차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통적 예술의 유미주의와 대중문화의 거리를 좁힌 것으로 이야기된다.
글. 이장로(미술평론가)
디자인. 전유림
Copyright © Weverse Magazine.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ad More
- RM 따라 한국 현대미술 알아가기202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