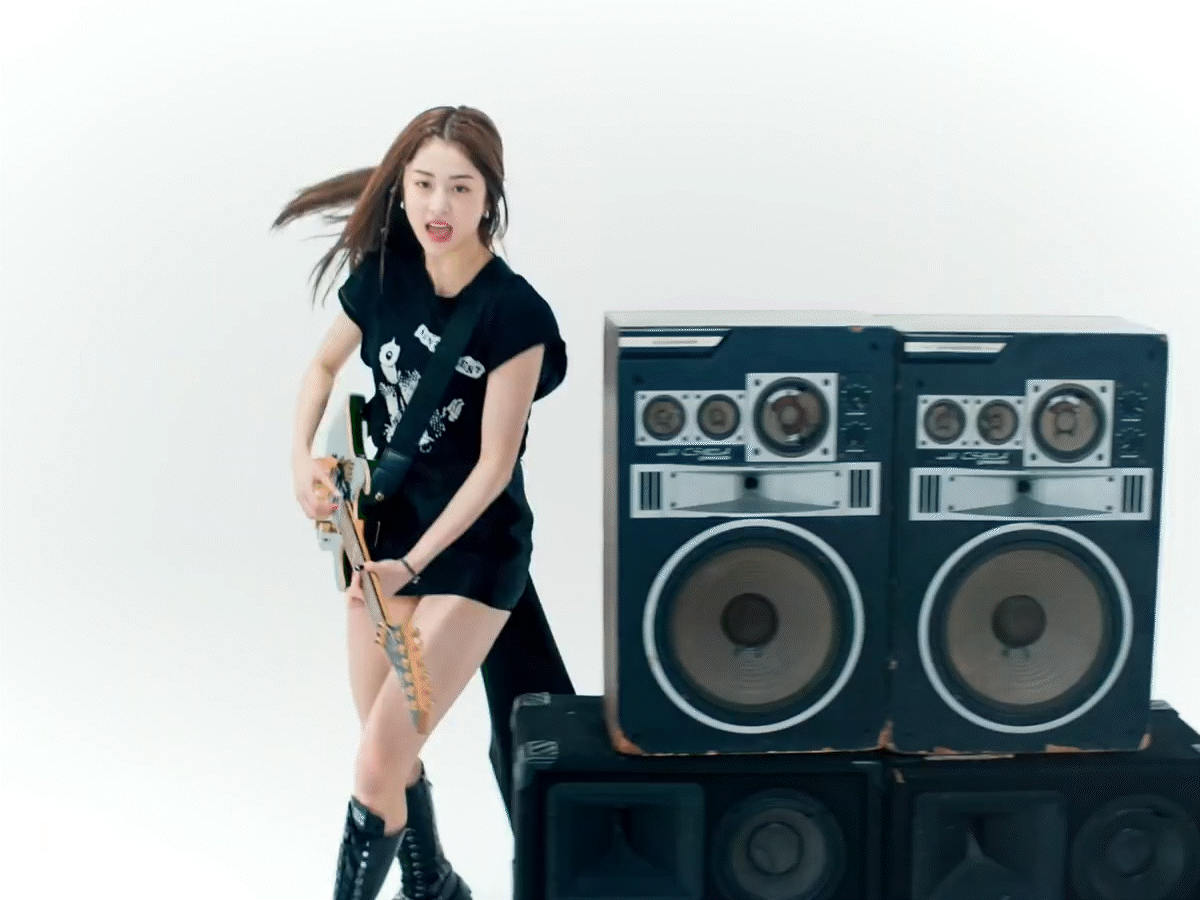사랑에 대해 쓰려면 수많은 논문과 책을 인용해야만 할 것 같다. 책 속의 철학자 수만큼이나 사랑에 대한 관점은 무수하고, 사랑의 종류 또한 다채롭다. 헤겔에겐 자아와 타자가 대립하면서도 이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통합된 상태를 형성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르트르에겐 자유와 소유욕 사이의 갈등이 사랑이다. 조금 더 일상적으로 풀어볼까. 누군가에게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사랑이고, 또 누군가에겐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첫 만남에서 느낀 강렬한 감정이 사랑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모니터 속에서만 만난 아이돌이 반드시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사랑일 것이다.
이 모든 정의의 전제는 동일하다. ‘타인’이 존재한다는 것.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결국엔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한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속 말들이 사랑에 대한 명확한 정의일지도 모른다. 르세라핌 허윤진의 자작곡을 듣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린 이유다.
그의 음악 속엔 언제나 ‘타인’이 존재한다. “I don’t know what I’d be doing without you(네가 없었다면 난 무엇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라는 가사처럼 타인의 존재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며 고마움을 표현한 ‘Raise y_our glass’도 그렇고,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궁금해하면서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달라고 고백하는 ‘피어나도록 (love you twice)’도 마찬가지다. 그의 시선은 외부에 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있다. 그들과 눈을 맞추며 피어오른 감정들, 마음속 어딘가에서부터 번진 뭉근한 온도의 사랑이 노랫말 곳곳에 담겨 있다.
반대로 시선의 방향이 타인에서 자신으로 향할 때도 있다. 직설적인 가사가 담긴 ‘I ≠ DOLL’이 그렇다. “어제는 인형 같고 오늘은 이년이라”고 아이돌을 평가하는 이름 모를 사람들의 시선을 빌린다. 이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조준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하는 무기가 된다. 그간 달려오며 마주했던 수많은 교차로, 그 순간순간의 결심이 만든 경로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깨닫는 ‘blessing in disguise’에서는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시적으로 확장한다. 그 시선의 끝엔 결국, ‘나’가 있다.

연필을 쥔 손이 나아가는 방향
허윤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장르가 아닌 이야기로 풀어내는 스토리텔러다. 그가 지금까지 솔로 싱글로 발표한 자작곡 다섯 곡은 장르적으로 통일성이 없다. 그러나 이는 이야기의 질감을 결정하고, 감정의 결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노랫말 속 이야기와 이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장르는 그의 음악 안에서 증폭된다.
‘I ≠ DOLL’처럼 직설적이고 강한 가사를 노래하기 위해 록과 힙합 장르인 트랩을 섞어 강렬한 사운드를 구축했고, ‘피어나도록 (love you twice)’ 같은 은근한 고백이나 주변 사람과 함께 이룬 가만한 날들에 대한 감사(‘Raise y_our glass’)는 어쿠스틱 팝에 담아 살랑거리는 봄바람 같은 마음을 구현했다. 리드미컬한 바이올린으로 시작부터 흥을 돋우고 기타 사운드로 전체적인 포장을 한 ‘blessing in disguise’는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를 신나는 디스코 장르로 승화한다.
허윤진의 자작곡 ‘해파리’ 속 대화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어쿠스틱 기타, 우쿨렐레 등을 활용해 깊은 바다, 유영하는 해파리, 잔잔한 파도, 그 위에 몸을 맡긴 모습을 포근하게 퍼지는 사운드로 구현한다. 잔잔한 프로덕션의 R&B 소울 장르는 해파리가 수영하는 너른 바다가 된다. 음악을 듣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해파리를 볼 수 있게 한다.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르와 악기를 선택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허윤진의 음악은 마치 연필로 그리는 그림 같다. 연필은 잉크처럼 한 번에 완결되지 않는다. 대신 지우고 덧대며 조금씩 다듬어진다. ‘해파리’ 역시 그러하다. 곡 전체는 마치 해파리가 물결에 몸을 맡겨 유유히 흘러가는 것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작은 관찰과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 허윤진은 그런 순간들을 겹겹이 쌓아가며 사랑의 얼굴을 그린다. 어느 날엔 같은 물결을 반복하며 짙은 명암을 더하고, 또 다른 날엔 잔잔한 파도를 따라 연한 바탕을 채우듯, 그는 곡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Just keep swimming
해파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생명체다. 물살을 따라서만 이동한다. 뇌도 심장도 뼈도 없으니 오로지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신경망으로만 환경 변화를 감지한다. 누군가는 이런 해파리의 모습을 낮잡아 볼 수도 있겠다. 이 거친 세상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배웠으니 말이다. 그러나 해파리는 바다의 온도나 깊이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살 수 있어, 지구를 뒤덮고 있는 바다 대부분은 해파리의 집이 된다. 일렁이는 파도를 따라 떠도는 모습은 우아해 보이기도 하고, 빛을 뿜어내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소통하는 모습은 자연이 선물하는 아름다운 빛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유약한 듯 보이는 해파리의 특성은 해파리만의 강점이 되기도 한다. 바다를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치환하고 해파리를 삶에 뚜렷한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무언가를 욕망하는 사람은 종종 삶의 파도에 저항하고 싶어 한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뚜렷하니 흐르는 대로 갈 수 없는 것이다. 파도에 쓸리고 가끔은 뒤집힌다.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삶에 뚜렷한 목적 없이 주어진 일상 속에서 매일 꾸준히 헤엄치는 사람은 삶의 파도에 충실하다. 예상하지 못한 상처가 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흐름을 따라 나아간다. 늘 그래왔듯이.
어느 것이 더 좋다고 가치를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해파리’ 속 그의 시선에서 해파리 혹은 해파리처럼 삶의 파도를 유유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자신과 대조되기 때문이다. “수면 위”의 것들을 상관하고 싶어 하고 그 마음이 자신을 괴롭혀 결국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어 하는 자신과.“I’m washed up on the shore(해변으로 떠밀려왔다)”라고 털어놓은 후 읊조리는 질문 “What am I searching for?(난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를 통해 그가 해파리와는 반대로 인생의 파고에 거세게 저항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해파리’는 단순히 해파리가 가진 삶의 태도나 외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끝내지 않는다. 가사 전체가 허윤진과 해파리가 나누는 대화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곡의 화자인 허윤진이 “목적도 없이 just cruising / 이끌려 넌 어딘가로”라고 말을 건네면 해파리가 대답하듯 노래한다. ‘그저 수영할 뿐, 딱히 좋은 이유는 없고, 사는 것에 별 의미도 없는 데다 심장까지 없’다고. “Just keep swimming”이라는 가사는 후반부에 다시 등장한다. 그 뒷말의 주어를 ‘나’로 바꾸어 “난 그냥 흘러가”라고 능동적인 맥락을 심는다. 해파리에게 위로받은 듯이. 혹은 동화된 것처럼.
허윤진의 노래 속 사랑은 누군가를 통해 출발하지만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스스로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그 깨달음은 삶 전체로 확장된다. 연필을 쥔 손은 매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새로운 이야기를 그려내지만, 연필의 끝이 완성하는 그림은 언제나 동일하다. 노래 속 화자, ‘나 자신’이다. 허윤진이 그리는 사랑의 몽타주는 그런 식으로, 매일 조금씩 완성된다.
- 허윤진 “르세라핌은 다정함을 배우게 해주는 것 같아요”2024.02.24

- 허윤진의 인스타그램 꾸미기2024.01.15

- 허윤진의 ‘청춘물 주인공 서사’ 같은 인생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