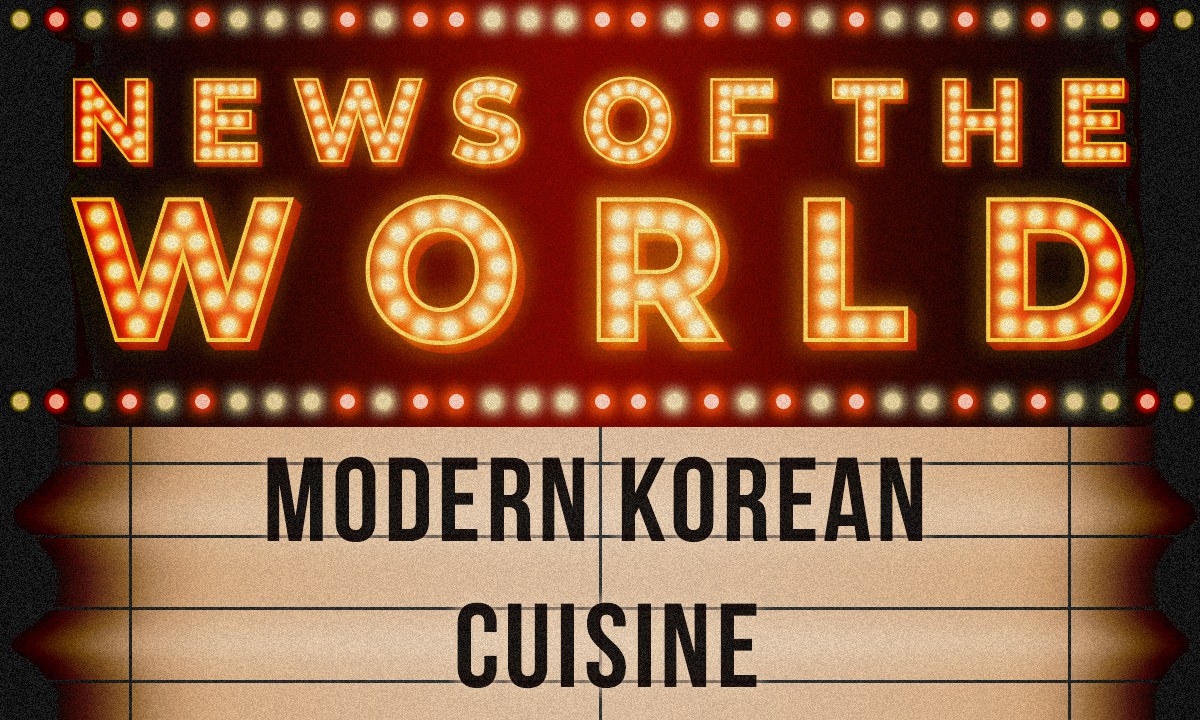
2002년 월드컵 이후 요리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 이 대열에는 특이하게도 사회 경험이 꽤 많은 부류들도 포함되었다. 회사가 직원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조직보다 개인의 삶에 충실하려는 경향의 반영이었다. 이들은 대개 30대 중반부터 50대까지 아우르는 나이였으며 남녀의 차이가 없었다. 요리 유학을 가는 이들이 주로 목표로 하는 나라는 유럽(프랑스, 이탈리아, 영국)과 미국, 같은 요리 문화를 가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었다. 유럽 음식은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해왔던 보수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이들에게 하나의 해방구였다. 이를테면 유럽 여러 나라가 누리는 긴 휴가, 자유로운 영업 방식 같은 것들을 우호적으로 수용했다. 한국 식당의 대부분을 이루는 한식집이나 동양 음식(중식과 일식) 식당은, 일주일에 6일, 어쩌면 7일을 열어야 하는 것이 룰이었고,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동양적 문화에 속했다. 이런 모델은 새로운 요리 지망생 세대에게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었다. 한국에서, 여름이나 겨울 한 달을 문 닫고 휴가를 떠나는 식당은 일종의 환상에 속했다. 그들은 귀국하여 유럽식 문화, 미국(주로 진보적인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 등 공교롭게도 이런 도시는 음식 문화가 발달하여 한국의 요리 유학생들이 선망하는 곳이기도 하다) 음식 문화를 공부하고 한국에 이식하는 선구자가 되었다.
고교를 갓 졸업하거나 앞서 거론한 ‘인생 리셋주의자들’ 모두 2002년 이후, 엄밀히 말해서 2010년을 앞뒤로 하여 한국에서 활약하기 시작했다. 이들로 인해, 한국의 요리 시장, 특히 고급 지향적인 강남(청담동)의 문화가 크게 변모한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놀라운 것은 서구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로컬 푸드, 슬로 푸드 등을 표방하였다. 한국에 양식이 이식된 19세기 말 고종 황제 시대 이후 음식 이름에 원산지를 밝히는 최초의 세대가 된 것이다. 이를테면, 제주산 딱새우, 서천산 가오리, 서산의 냉이, 속초의 문어, 울릉도의 약초 같은 이름이 메뉴판에 등장했다! 요리 이름은 점점 더 길어졌으며(서구의 미쉐린 쓰리 스타급 레스토랑이 그러듯이) 두 줄을 넘는 경우도 흔했다. 이런 흐름은 어떤 계기로 더욱 급격한 진로 변경을 하게 된다. 내 기억에 충격적인 것은, 미국의 CIA(제이슨 본을 떠올리지는 마시라)를 졸업하고 강남 요충지에 문을 연 한 젊은 셰프가 ‘모던 코리안 퀴진’을 표방했다는 점이다. 그가 처음부터 이것을 내세웠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분명한 건, 그런 흐름이 고급 음식의 대세가 되기 시작했고 많은 서양식 음식을 전공한 요리사들이 그 대열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그는 심지어 ‘취나물 빵’을 내고 해조류를 요리하기도 했다. 알다시피, 나물은 한식의 대표적 영혼이지만, 그다지 외국인에게 어필하지는 못했던 요리다(테이블 바비큐, 갈비를 이길 한식 아이템은 없었다. 외국인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맛이었으니까). 게다가 해조류라니! 한국은 해조류를 적어도 일고여덟 가지를 먹으며, 누구나 그 이름을 구별할 줄 알지만 서구 대중들에게는 그저 ‘바닷 풀’ 말고 달리 구별되는 법이 있던가. 그러니까 그가 표방한 모던 코리안은 정말로 모던하다 못해 폭탄 같은 것이었다. 이는 아마도, 그들이 미국의 요리 심장부 뉴욕에서 공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뉴욕은 어떤 나라의 음식이라고 녹여내고, 소비되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다. 이런 도시의 공기를 흡입한 청년 요리사들이 현지에서 한식의 진정한 왕이자 코어로 불리는 김치를 이용한 요리를 팔고, 그것을 응용한 칵테일(!)을 파는 현장을 목격했으니 한국에서 모던 코리안 퀴진을 내는 건 당연하게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일군의 셰프들은 뉴욕에서 김치 음식을 한국인이 아닌 현지인을 대상으로 개발했다. 미쉐린 투 스타를 받은 ‘정식당’에서는 메인 요리에 김칫국물을 소스로 제공했다. 김치는 오랫동안 서구인에게 접근되었고, 특히 한국 정부와 문화 단체에 의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호기심 그 이상의 반응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모던 코리안 퀴진은 미쉐린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더욱 가속되었고, 하나의 경향을 넘어 표준화된 방식으로 정착하고 있다. 서양식(프랑스식이든 이탈리아식이든)의 조리 방식과 주방 구성을 표준으로 하여 한식의 재료와 조리 방법을 비틀어(이것을 퓨전이라 불러도 된다) 제공한다. 즉, 서구식 표준적인 고급 레스토랑 같지만, 음식의 재료나 풍미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형태다. 더구나 미쉐린이 서울의 별들을 선정하면서 이런 방식의 식당을 아주 많이 포함시키고 있는 현상이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또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고급 한식(이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한 구별이 어렵다. 양반가의 음식인지, 아니면 궁중 음식의 파장 안에 있는지)으로 짐작되는 방식으로 만들되, 요리와 서빙의 방식을 미니멀하게 조정하는 서구식 파인다이닝 형태를 띠는 식당도 미식가들과 고급 레스토랑 애호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한식은 오랫동안 복잡한 변화를 내외부에서 일으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가장 강한 강도의 충격은 근래 10여 년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마도 미디어의 혁명, 앙팡 테리블 같은 셰프들의 등장, 소득의 향상 같은 것들이 그 토대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한식은 앞으로 어떻게 더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
 ©️ Chanil Park
©️ Chanil Park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금, 모두를 위한 K-푸드202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