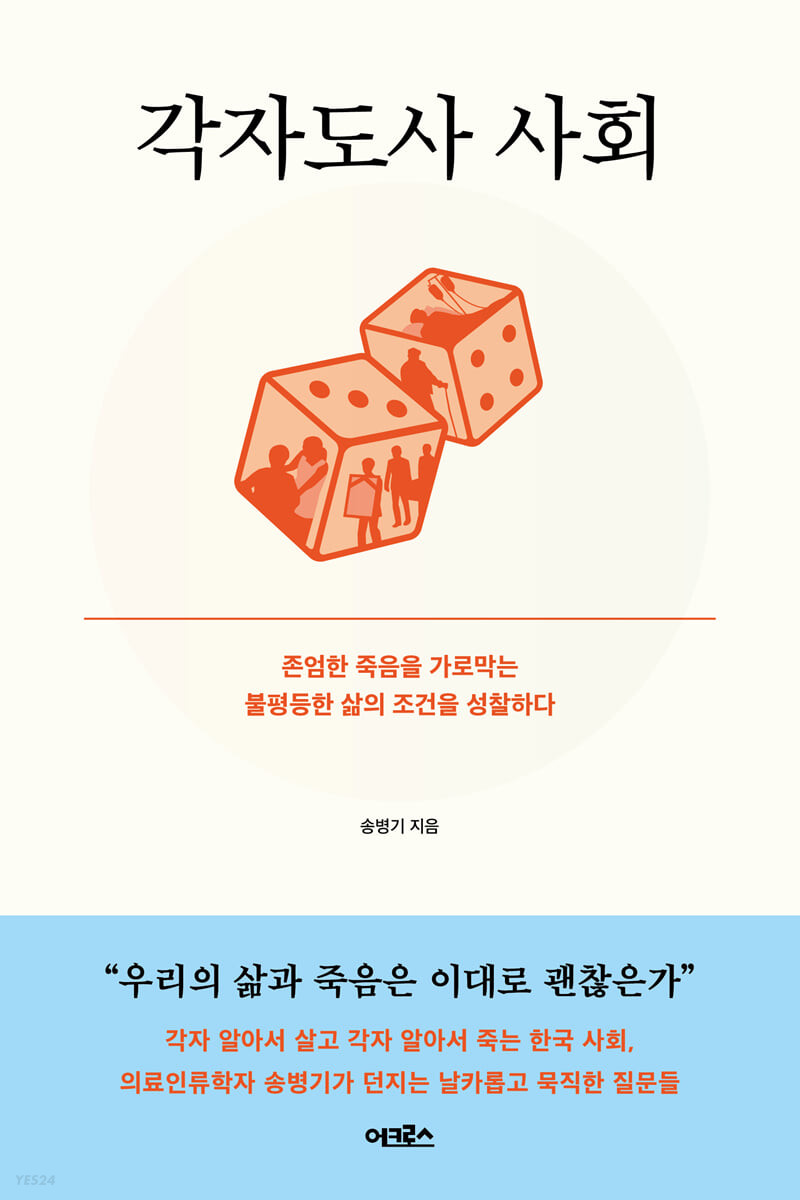‘문명특급 - MMTG’
오민지: “‘살아 봤으면 해’가 아니라 ‘사서 고생’ 아니야?” 한 팬의 반응은 ‘문명특급’ 5주년 특별 기획 ‘살아봤으면 해 -TXT편’을 한마디로 설명한다. 이 영상에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약 3분의 SBS ‘인기가요’ 무대를 위해 드라이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본 방송 녹화, 로닌 카메라 녹화, 지미집 카메라 녹화를 하며 매 무대의 카메라 위치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한 후 안무를 수정한다. 그리고 무대 사이에는 단.사(단체 사진), 오.투(‘#오늘의TXT’)와 개인 사진 촬영, 틱톡 챌린지 스케줄이 계속된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자정의 창가에서 만난 악마의 목소리는 달콤했다(‘Devil by the Window’)’가 아니라 본인이 악마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스케줄을 웃으며 소화하는 동안 지금까지의 ‘문명특급’ 에피소드 중 가장 낮은 에너지의 재재가 지친 표정으로 “악마 죽여버려”, “이제 퇴근하면 되나요?”라며 퇴마와 퇴근을 갈망하는 그 간극의 이유에 대해 멤버들은 각자의 표현으로 하나의 동일한 대상을 언급한다. 영상의 댓글처럼 “24시간 이상 깨어 있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무대를 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돌의 좋은 결과만 보고 이면에 힘든 준비 과정은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하루 종일 밤새고 일하는데 그래도 웃”는 이유와도 동일할 것이다. “모아분들을 보면 조금 (체력이) 올라와요.”, “(모아의) 함성을 들으면” 그리고 3분여가량의 “그 영상을 한 시간 동안 계속 볼 수도 있는” 모아를 위해.
‘TAR 타르’
임수연(‘씨네21’ 기자): 베를린 필하모닉 최초의 여성 지휘자. 에미상, 그래미상, 아카데미상, 토니상을 석권하며 미국 대중문화계의 그랜드 슬램이라 불리는 ‘EGOT’를 획득한 예술가. 자서전 ‘멈추지 않는 타르’ 출간 예정. 지휘자로서 이룰 수 있는 거의 모든 명성을 누리고 있는 리디아 타르(케이트 블란쳇)는 꿈에 그리던 말러 교향곡 5번 녹음을 앞두고 있다. 정점에 오른 순간 역설적으로 그녀의 추락이 시작된다. 영화 ‘TAR 타르’는 예술계 내 성차별을 극복한 여성 예술가의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가 아니다. 리디아 타르는 오랫동안 여성 제자들을 착취한 그루밍 성범죄자이며 현 시점에도 같은 여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심지어 모함한다. 영화는 성소수자 여성이 위계에 의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불편한 상황에 관객을 던져놓은 후 가해자의 내면을 따라가는 담대한 태도를 취한다. 예술과 권위, 매혹의 자기파괴성, 예술과 예술가의 도덕성에 관한 논쟁적 질문이 기묘한 호흡으로 얽혀 들어간다. 허구의 인물 타르를 연기한 케이트 블란쳇은 올해 가장 유력한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로 떠올랐다.
‘각자도사 사회 (존엄한 죽음을 가로막는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성찰하다)’ - 송병기
김겨울(작가):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대개 자신의 죽음이 존엄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상상하지만, 운명의 주사위는 그렇게 너그럽지 않다. 맑은 정신으로 좋은 돌봄을 받다가 눈을 감는 이상적인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나의 죽음은 병원으로 올 것인가, 요양원으로 올 것인가, 집으로 올 것인가. 나의 돌봄은 가족의 얼굴로 올 것인가, 간병인의 얼굴로 올 것인가, 혹은 아예 오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스펙트럼 안에서 죽음으로 가는 과정은 결코 평등하지도 순탄하지도 않다. 의료인류학자인 저자는 이러한 죽음의 여러 면을 관찰하며 우리 사회의 죽음이 어떠한 사회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고찰한다. 결국 모두는 죽기에, 죽음은 우리 모두의 그리고 사회의 일일 수밖에 없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하고 노후 대비를 잘해야 한다는 반복되어온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의 죽음이 존엄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책.
‘오르페우스’ – 공중그늘
김윤하(대중음악 평론가): 세상이 온통 자극투성이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화려하게. 고만고만한 것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사이에서 어떻게든 눈에 띄기 위한 고군분투가 눈물겹다. 1.5배속으로 드라마를. 1분 미리 듣기로 음악을 ‘체크’하는 세상 속에서 저기,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인다. 터덜터덜 같기도, 흐느적흐느적 같기도 한 울렁임으로 움직이는 등을 가만히 바라본다. 이런 세상에서 저래서 쓰겠나 싶은 괜스러운 걱정은 이내 나도 함께 따라 걷고 싶다는 묘한 욕망으로 뒤바뀐다. “괜찮아 괜찮아 나아가고 있어”.
‘오르페우스’는 2016년 결성 이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밴드 공중그늘의 두 번째 EP 타이틀 곡이다. 드림 팝, 슈게이징 사운드를 중심으로 매번 꿈결 같은 이야기와 멜로디를 들려주고 있는 이들은, 노래 ‘오르페우스’를 통해 밴드명에서 음악까지 자신들에게 큰 영감이 되어준 밴드 피쉬맨즈(Fishmans)를 소환한다. 드림팝, 덥, 레게, 앰비언트가 자유롭게 섞인 독보적인 스타일로 이후 데뷔한 한일 인디 밴드들에게 무한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유명한 이들의 고유한 리듬이 공중그늘의 투명하고 여린 날개에 실려 두둥실 떠간다. 등 뒤에서 들리는 조그마한 콧노래가, 어디선가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우리를 자꾸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자극의 자리에 낭만을 끼워 넣는다. 온통 평화롭고 따뜻하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