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ATURE
BTS와 TXT의 디스코
빅히트+디스코가 만든 새로운 의미
2020.11.04
한국 대중문화는 특정 음악 장르를 표피적으로, 패션과 몸짓으로만 소진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큰 피해자를 뽑는다면 헤비메탈과 디스코일 것이다. 둘 사이에도 차이는 있다. 헤비메탈은 국내에서 미디어 등에 의해 종종 희화화의 대상이 되면서 이 시대로 좀처럼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K-POP의 디스코는 적당한 때가 되면 돌아오는 주요 스타일 중 하나다. 대개 '복고'라는 구호를 선두에 두고, 디스코가 디테일을 담당한다. 그러나 1970~90년대 유산이 무수한 소환과 반복을 겪으면서 '복고'라고 말하는 것조차 어색한 시점이 왔다. 지금 디스코가 실패한다면 이 어색함을 짚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연히도 ‘복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시점에, K-POP은 글로벌 음악 시장의 중요한 흐름이 되었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Dynamite’,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로 이어지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의 디스코를 조금은 다른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다.
디스코의 역사를 '토요일 밤의 열기'로부터 ‘디스코 파괴의 밤' 정도로 요약하면, 이 장르는 대중적 성공에 이어 자기 복제를 거치다 때로는 특정 세력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 뒤 몰락한 존재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장르의 선구자들에게 디스코는 다양성과 소수의 권리에 대한 찬가이자 투쟁의 도구다. 1970년대 초기 클럽에서 디제이들은 미국의 펑크, 라틴 리듬, 유럽 스타일의 전자음을 뒤섞고, 서로를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댄스 플로어에 쏟아내고 있었다. 무대는 더이상 커플 댄스가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다. 디스코가 성별, 인종, 계급을 넘어서는 가치를 일견 무해한 댄스 트랙에 담았을 때, 록 음악을 틀던 라디오 디제이가 주도하여 야구장에서 디스코 음반을 불태운 ‘디스코 파괴의 밤’은 어느 정도 운명에 가까운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디스코 이후로도 클럽 문화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디스코가 흑인/라틴/이탤리언/여성/게이 아티스트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했는지 밝히는 것은 클럽 바깥의 몫이 되었다.
그래서 최근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혐오와 그에 대한 저항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시대에 디스코의 복귀를 희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종과 계층, 성정체성 등의 갈등이 폭발한 시대에 디스코는 ‘복고’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대중음악에 관하여 미국에서의 성공이 곧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이나 다름없다면, 아시아의 보이 밴드에게 그 길은 너무 좁았다. K-POP 보이 밴드는 미국 문화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남성상과 전적으로 대치한다. 방탄소년단은 이 길을 넓혀 놓았고, 이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동양인이라는 선택지 하나를 추가한 것 이상으로 의미가 깊다. 보이 밴드, 소수 인종, 대안적 남성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방탄소년단의 첫 번째 영어곡, ‘Dynamite’가 디스코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미국 대중음악 역사와 사회적 맥락 양면에서 의미심장하다. 그것도 이 시대에 활기찬 일상의 기쁨을 묘사하는 곡이라면 더더욱.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는 청량함이라는 보이 밴드의 콘셉트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디스코를 응용하지만, 이 노래는 현실인지 다른 세계일지 모를 어떤 곳에서 특별한 순간의 행복을 노래한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이번 앨범 ‘minisode1 : Blur Hour’에 함께 수록된 ‘날씨를 잃어버렸어’, ‘하굣길’ 등의 곡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10대의 일상을 담고 있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이 곡에는 새로운 맥락이 생긴다. 코로나19로 인해 거리에 당연한 일상을 빼앗긴 10대가 찰나의 행복을 노래할 때 디스코가 나온다. 이것은 보이 밴드와 만난 디스코의 변형이자 디스코가 왜 이 시대의 또 다른 축제 음악일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디스코의 역사를 '토요일 밤의 열기'로부터 ‘디스코 파괴의 밤' 정도로 요약하면, 이 장르는 대중적 성공에 이어 자기 복제를 거치다 때로는 특정 세력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 뒤 몰락한 존재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장르의 선구자들에게 디스코는 다양성과 소수의 권리에 대한 찬가이자 투쟁의 도구다. 1970년대 초기 클럽에서 디제이들은 미국의 펑크, 라틴 리듬, 유럽 스타일의 전자음을 뒤섞고, 서로를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댄스 플로어에 쏟아내고 있었다. 무대는 더이상 커플 댄스가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다. 디스코가 성별, 인종, 계급을 넘어서는 가치를 일견 무해한 댄스 트랙에 담았을 때, 록 음악을 틀던 라디오 디제이가 주도하여 야구장에서 디스코 음반을 불태운 ‘디스코 파괴의 밤’은 어느 정도 운명에 가까운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디스코 이후로도 클럽 문화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디스코가 흑인/라틴/이탤리언/여성/게이 아티스트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했는지 밝히는 것은 클럽 바깥의 몫이 되었다.
그래서 최근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혐오와 그에 대한 저항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시대에 디스코의 복귀를 희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종과 계층, 성정체성 등의 갈등이 폭발한 시대에 디스코는 ‘복고’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대중음악에 관하여 미국에서의 성공이 곧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이나 다름없다면, 아시아의 보이 밴드에게 그 길은 너무 좁았다. K-POP 보이 밴드는 미국 문화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남성상과 전적으로 대치한다. 방탄소년단은 이 길을 넓혀 놓았고, 이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동양인이라는 선택지 하나를 추가한 것 이상으로 의미가 깊다. 보이 밴드, 소수 인종, 대안적 남성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방탄소년단의 첫 번째 영어곡, ‘Dynamite’가 디스코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미국 대중음악 역사와 사회적 맥락 양면에서 의미심장하다. 그것도 이 시대에 활기찬 일상의 기쁨을 묘사하는 곡이라면 더더욱.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는 청량함이라는 보이 밴드의 콘셉트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디스코를 응용하지만, 이 노래는 현실인지 다른 세계일지 모를 어떤 곳에서 특별한 순간의 행복을 노래한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이번 앨범 ‘minisode1 : Blur Hour’에 함께 수록된 ‘날씨를 잃어버렸어’, ‘하굣길’ 등의 곡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10대의 일상을 담고 있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이 곡에는 새로운 맥락이 생긴다. 코로나19로 인해 거리에 당연한 일상을 빼앗긴 10대가 찰나의 행복을 노래할 때 디스코가 나온다. 이것은 보이 밴드와 만난 디스코의 변형이자 디스코가 왜 이 시대의 또 다른 축제 음악일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방탄소년단의 긍정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청량함이 미국 대중음악의 일부 선정적인 면모에 대한 대안으로 작동한다는 시각은 옳다. 하지만 그뿐이라면 ‘Parental Advisory’ 걱정이 없는 건전함이 인기의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단순한 접근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염병이 떠도는 시대라면 사람들은 단지 행복한 음악을 찾을 수도 있다. 두아 리파의 ‘Don’t Start Now’의 프로듀서 이안 커크패트릭(Ian Kirkpatrick)이 ‘나일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작곡진인 캐롤라인 에일린(Caroline Ailin), 에밀리 워렌(Emily Warren)과 이 곡을 만들기 전, 미국 교외의 어느 바에서 체크 셔츠를 입은 백인 손님들이 ‘YMCA’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디스코를 계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겸손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를 편견 없이 바라보는 대중 예술가의 자신감에 가깝다. 지금은 디스코가 필요한 때다.
빅히트의 디스코가 얼마나 의도적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흥겨움이 과거 K-POP의 그것과 달리, 얼마나 새롭고 풍부한 의미를 담아내는지 말할 뿐이다. 이 디스코는 '백인 남성'이 디스코에 불을 질러 자신의 힘을 되찾았던 30년 전 밤에 맞닿아 있다.
빅히트의 디스코가 얼마나 의도적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흥겨움이 과거 K-POP의 그것과 달리, 얼마나 새롭고 풍부한 의미를 담아내는지 말할 뿐이다. 이 디스코는 '백인 남성'이 디스코에 불을 질러 자신의 힘을 되찾았던 30년 전 밤에 맞닿아 있다.
글. 서성덕(대중음악 평론가)
사진 출처. 빅히트 뮤직
Copyright © Weverse Magazine.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ad More
- ‘Dynamite’가 장벽을 뛰어넘은 순간들2020.10.19

- [인터렉티브] BTS와 ARMY, 어둠을 밝히는 우리의 소우주2020.0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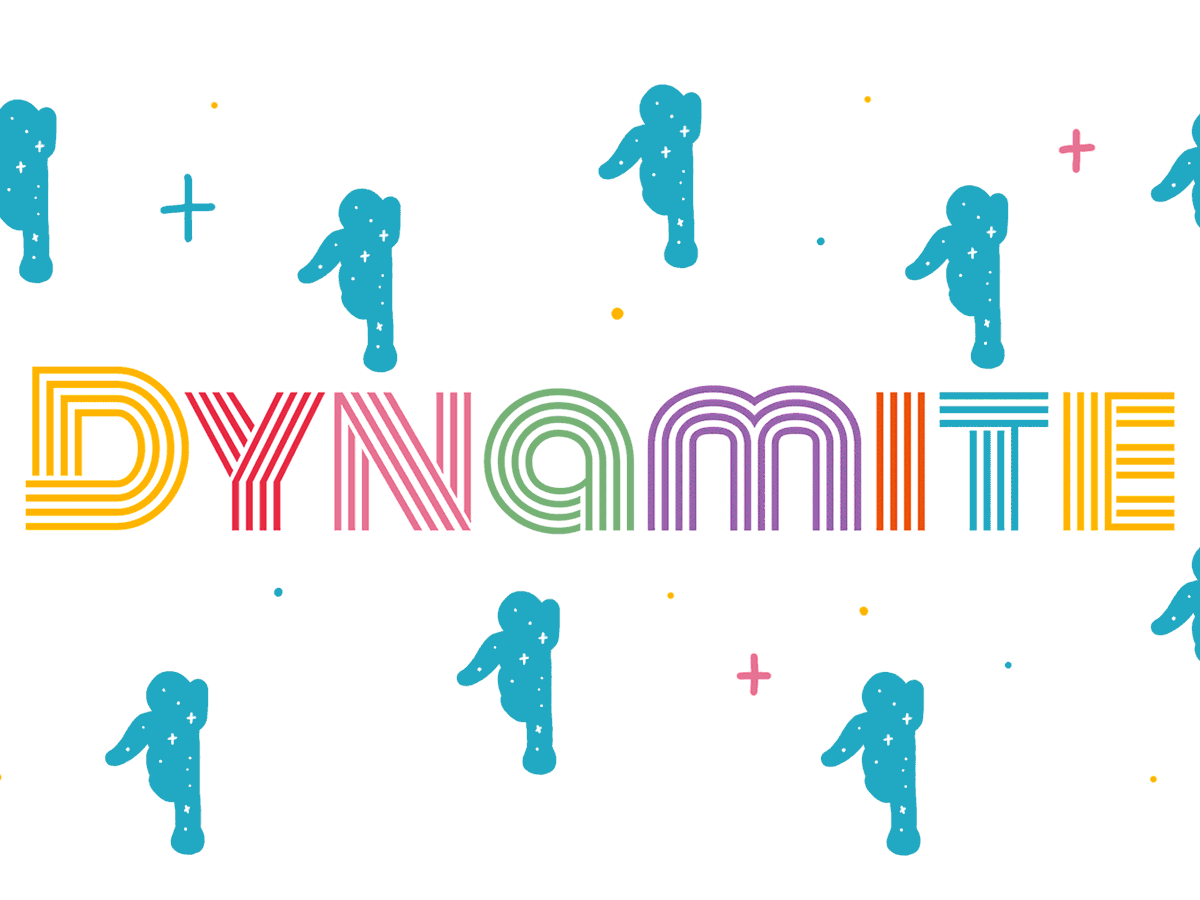
- ‘Dynamite’가 왜 대단하냐면2020.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