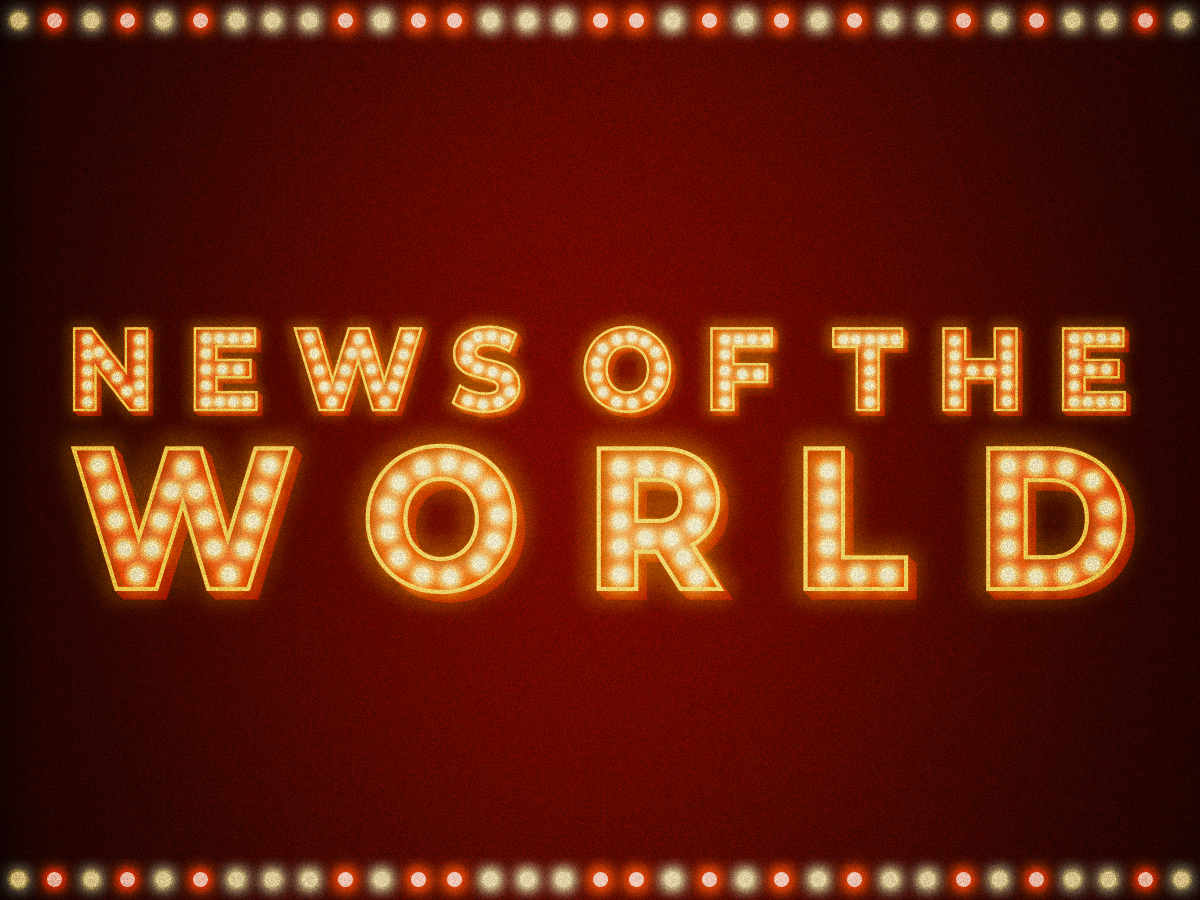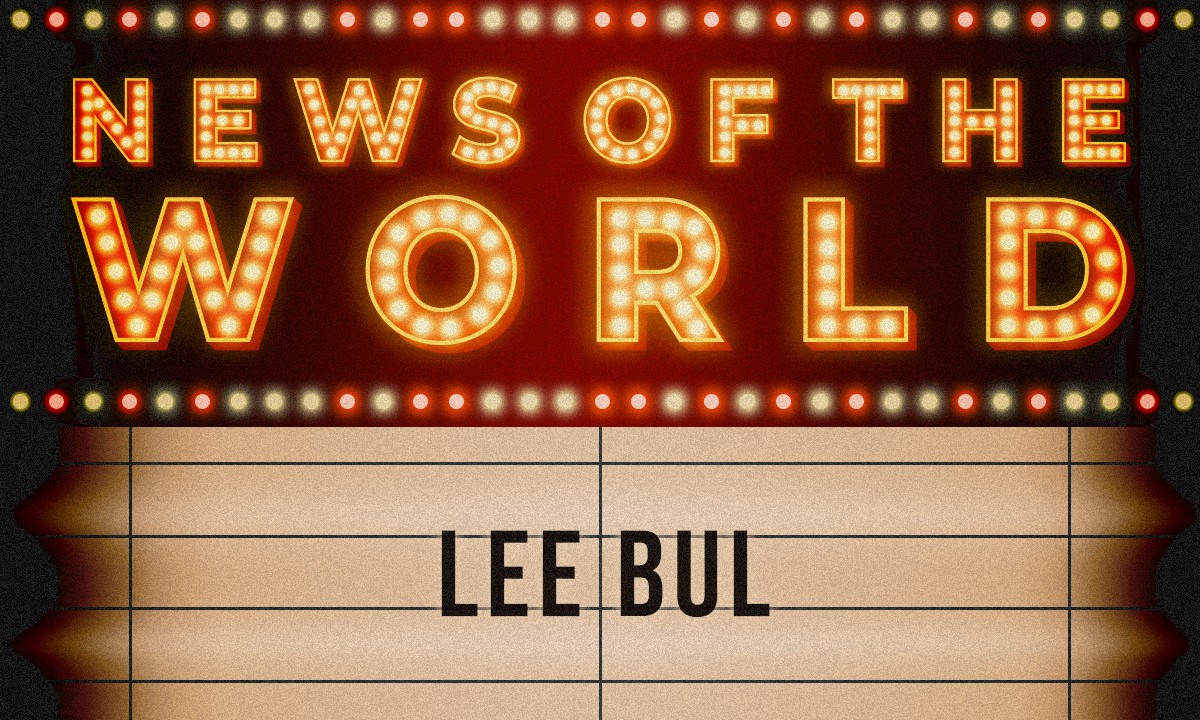
NoW
[NoW] 이불 : 시작
인류와 세계를 이야기하는 작가
2021.05.07
일렁이는 작품의 생명력이 피부로 전달되는 예술가는 하룻밤 사이에 문득 생겨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작가와 작품을 심도 있게 이해할 때 그 흔적을 되돌아보는 것은 늘 중요한 실마리가 되어 왔다. 3월 2일부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불 : 시작’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이불의 초기 작품 활동을 조명하는 전시로서 10여 년 동안 발표되었던 ‘소프트 조각’과 ‘퍼포먼스 기록’을 우리에게 선보인다.
전위적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이불의 작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를 통찰하는 작가의 시각을 보여왔지만, 그 기저에는 그가 살아온 시대적, 젠더적 경험과 연구가 녹아들어 확장되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1987년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한 이후, 본격적인 작업 활동을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이불은 기존 보수적 분위기의 미술계에 대항하여,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전통에서 벗어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경직되어 있던 당시의 미술계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의 본관으로 들어서자마자 만날 수 있는 거대한 작품 ‘히드라’는 바로 그러한 시기의 연장선에서 탄생한 작품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작업이다. 이미지가 프린트되어 있는 풍선 모뉴먼트는, 공기 펌프가 연결되어 있어 관객들이 발로 밟아 일으켜 세우는 역설적 참여 과정을 거친다. 그 결과, 우뚝 선 작품에서 보이는 것은 복합적인 아시아 여성으로 분장한 작가의 모습으로, 오리엔탈리즘의 뒤틀린 시각과 여성에 대한 사회의 통념을 패러디하고 비웃으며 작업 세계에서 내재되어 왔던 시선의 분위기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이어지는 전시실에서는 20대의 이불이 제작했던 작품들의 모습을 통하여, 작업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장 중앙에 자리 잡은 기괴한 형상의 ‘소프트 조각’들은 분명 인체를 연상시키지만, 분절되고 기형적인 모습의 조합에서 알 수 없는 공포와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보편적인 미적 감수성과 거리가 있는 내장 기관, 촉수들을 연상시키는 작품들은 그 유기적인 생명성으로 인하여, 세계를 지각하는 주체적인 몸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며 다음 전시실의 파격을 예고한다.
웅얼거리듯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 빔 프로젝터에서 재생되는 불빛만으로 구분되는 어두운 전시실, 벽면을 가득 채운 신체와 몸짓의 퍼포먼스로 묘사되는 2전시실의 경험은 보는 이들에게 지극히 이질적인 환경이다. 작가가 실연했던 다수의 퍼포먼스 중, 12개의 기록 영상을 집약한 이 공간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을 목도하며, 피부의 조각조각이 꿈틀거리는 듯한 강렬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전시장이라는 거대한 블랙박스 안에서, 영상의 대상으로 기록된 작가의 행위를 보는 시신경의 감각은, 그 신체성이 난무하는 노골적 광경과 시대를 바라보는 메타포에서 비롯된 작업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현재를 새삼 깨닫게 만든다. 자신의 신체를 스크린으로 삼아 젠더 이슈, 동양과 서양, 대중과 엘리트 등의 사회상에 대해 끊임없이 발언해온 작가의 여러 활동은 자연스럽게 아브젝트(abject)로 활용되는 미술에서의 몸(flesh)을 연상시키며 충돌하는 의미들을 동시에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전시실에서도 그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1997년 뉴욕현대미술관(MoMA)에 출품한 ‘장엄한 광채’는 날생선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설치한 작품으로 시간에 따라 부패하며 변화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작업이었기에, 악취를 이유로 미술관에서 철거당하여 소송을 경험하기도 했다. 당시 미술관의 권위에 정면으로 부딪힌 작품이었으며 미술관을 상대로 승소하여, 이불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로 자리 잡게 된다. 화려하게 치장한 날생선은 신체에 대한 은유였으며, 그것이 부패하여 외면받고 퇴출로 이어지는 결말에서 사회에 팽배한 시선과 관습을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전시를 통해 둘러본 작가 이불의 초기 작업들은 30년이 지났음에도 현재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기에, 센세이션을 바라본 2000년대 초 한국 미술계에선 그를 ‘현대미술의 여전사’로 칭하곤 했다. 작업을 진행하는 내내 이분법적 시선과 충돌하는 관습에 대해 이야기했던 작가에게 끝까지 ‘여’를 부여했다는 것이 시대의 아이러니겠지만, 현대의 이불은 그 단계를 넘어 인류와 세계를 이야기하는 작가로 남았음에는 분명하다.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까지 유효한 의심과 사유로 이어지고 있는 작가인 만큼, 지금의 이야기들이 현시대를 넘어 미래의 어디까지 바라보게 될 것인지는, 훗날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경험해봐야 할 무대로 남을 것이다.
전위적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이불의 작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를 통찰하는 작가의 시각을 보여왔지만, 그 기저에는 그가 살아온 시대적, 젠더적 경험과 연구가 녹아들어 확장되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1987년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한 이후, 본격적인 작업 활동을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이불은 기존 보수적 분위기의 미술계에 대항하여,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전통에서 벗어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경직되어 있던 당시의 미술계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의 본관으로 들어서자마자 만날 수 있는 거대한 작품 ‘히드라’는 바로 그러한 시기의 연장선에서 탄생한 작품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작업이다. 이미지가 프린트되어 있는 풍선 모뉴먼트는, 공기 펌프가 연결되어 있어 관객들이 발로 밟아 일으켜 세우는 역설적 참여 과정을 거친다. 그 결과, 우뚝 선 작품에서 보이는 것은 복합적인 아시아 여성으로 분장한 작가의 모습으로, 오리엔탈리즘의 뒤틀린 시각과 여성에 대한 사회의 통념을 패러디하고 비웃으며 작업 세계에서 내재되어 왔던 시선의 분위기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이어지는 전시실에서는 20대의 이불이 제작했던 작품들의 모습을 통하여, 작업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장 중앙에 자리 잡은 기괴한 형상의 ‘소프트 조각’들은 분명 인체를 연상시키지만, 분절되고 기형적인 모습의 조합에서 알 수 없는 공포와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보편적인 미적 감수성과 거리가 있는 내장 기관, 촉수들을 연상시키는 작품들은 그 유기적인 생명성으로 인하여, 세계를 지각하는 주체적인 몸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며 다음 전시실의 파격을 예고한다.
웅얼거리듯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 빔 프로젝터에서 재생되는 불빛만으로 구분되는 어두운 전시실, 벽면을 가득 채운 신체와 몸짓의 퍼포먼스로 묘사되는 2전시실의 경험은 보는 이들에게 지극히 이질적인 환경이다. 작가가 실연했던 다수의 퍼포먼스 중, 12개의 기록 영상을 집약한 이 공간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을 목도하며, 피부의 조각조각이 꿈틀거리는 듯한 강렬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전시장이라는 거대한 블랙박스 안에서, 영상의 대상으로 기록된 작가의 행위를 보는 시신경의 감각은, 그 신체성이 난무하는 노골적 광경과 시대를 바라보는 메타포에서 비롯된 작업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현재를 새삼 깨닫게 만든다. 자신의 신체를 스크린으로 삼아 젠더 이슈, 동양과 서양, 대중과 엘리트 등의 사회상에 대해 끊임없이 발언해온 작가의 여러 활동은 자연스럽게 아브젝트(abject)로 활용되는 미술에서의 몸(flesh)을 연상시키며 충돌하는 의미들을 동시에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전시실에서도 그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1997년 뉴욕현대미술관(MoMA)에 출품한 ‘장엄한 광채’는 날생선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설치한 작품으로 시간에 따라 부패하며 변화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작업이었기에, 악취를 이유로 미술관에서 철거당하여 소송을 경험하기도 했다. 당시 미술관의 권위에 정면으로 부딪힌 작품이었으며 미술관을 상대로 승소하여, 이불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로 자리 잡게 된다. 화려하게 치장한 날생선은 신체에 대한 은유였으며, 그것이 부패하여 외면받고 퇴출로 이어지는 결말에서 사회에 팽배한 시선과 관습을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전시를 통해 둘러본 작가 이불의 초기 작업들은 30년이 지났음에도 현재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기에, 센세이션을 바라본 2000년대 초 한국 미술계에선 그를 ‘현대미술의 여전사’로 칭하곤 했다. 작업을 진행하는 내내 이분법적 시선과 충돌하는 관습에 대해 이야기했던 작가에게 끝까지 ‘여’를 부여했다는 것이 시대의 아이러니겠지만, 현대의 이불은 그 단계를 넘어 인류와 세계를 이야기하는 작가로 남았음에는 분명하다.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까지 유효한 의심과 사유로 이어지고 있는 작가인 만큼, 지금의 이야기들이 현시대를 넘어 미래의 어디까지 바라보게 될 것인지는, 훗날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경험해봐야 할 무대로 남을 것이다.
-
 ©️ Jangro Lee
©️ Jangro Lee
TRIVIA
아브젝트(Abject)
아브젝트(Abject)는 ‘비천함’이라고 번역되는 개념으로서 프랑스 사상가 줄리아 크리스테바에 의해 이론화되었다. 저서인 ‘공포의 권력’에 따르면 시체, 변형된 신체 부분, 배설된 것 등 신체의 안정성에 충돌하는 것들에 대한 심리적 거부와 혐오감이다. 이에 따라 보편적인 미감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브젝트 미술(Abject art)은 사회적 금기의 벽을 허물고 혼성의 문화를 발생시키는 의미를 내포한다.
아브젝트(Abject)
아브젝트(Abject)는 ‘비천함’이라고 번역되는 개념으로서 프랑스 사상가 줄리아 크리스테바에 의해 이론화되었다. 저서인 ‘공포의 권력’에 따르면 시체, 변형된 신체 부분, 배설된 것 등 신체의 안정성에 충돌하는 것들에 대한 심리적 거부와 혐오감이다. 이에 따라 보편적인 미감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브젝트 미술(Abject art)은 사회적 금기의 벽을 허물고 혼성의 문화를 발생시키는 의미를 내포한다.
글. 이장로(미술평론가)
디자인. 전유림
Copyright © Weverse Magazine.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ad More
- [NoW] 앤디 워홀에게 가는 파티장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