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모르포시스(metamorphosis)’라는 단어가 있다. 우리말로 ‘변태(變態)’를 뜻한다. 유체가 성체가 되는 과정, 어제와 급격하게 달라진 오늘. 번데기를 찢고 나와 세상을 자유롭게 날게 된 나비의 모습이나 뒷다리가 쑥 나왔다던 노랫말 속 개구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다. 우리는 자연스레 이를 ‘성장’이라 부르지만, 메타모르포시스는 조금 다르다. 성장은 연속이지만 메타모르포시스는 단절에 가깝다. 이전의 존재는 없는 것이 된다. 다소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이전의 것을 죽이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만이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다.
백예린이라는 우주
데뷔가 아닌 발견에 가까웠다. 피프틴앤드(15&)로 대중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내던 때를 생각해보면, 백예린이 대중에게 다가가려고 하기보다 대중이 백예린에게 다가가는 모양새였다. 출중한 실력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며 큰 주목을 받은 멤버와 함께 서 있어도 대중은 둘의 보컬을 고루 언급했다. 차분한 발라드, 그루비한 R&B, 스윙 요소가 섞인 빠른 템포의 곡까지 모두 소화하면서도 탄탄한 발성으로 폭넓은 음역을 오가던 그였다. 정밀한 기술 위에 포근한 질감의 음색이 겹치면서 그는 따뜻함과 완성도를 고루 갖춘 매력으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다.
역량은 곧 스타성이 되었다. 누군가의 그림자에도 가려지지 않는 목소리는 온전히 백예린으로만 채운 곡을 기대하게 했고, 그렇게 2015년 세상에 드러난 백예린의 첫 솔로 앨범 ‘FRANK’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에 충분했다. 감성적인 R&B 선율에 얹어진 그의 목소리는 이전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우주를 구축했다. 그룹 활동 때처럼 역동적인 멜로디나 테크닉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그 부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온전함이 있었다. 대중은 그 목소리를 따라 새로 열린 세계로 들어갔다. ‘솔로 R&B 아티스트’ 백예린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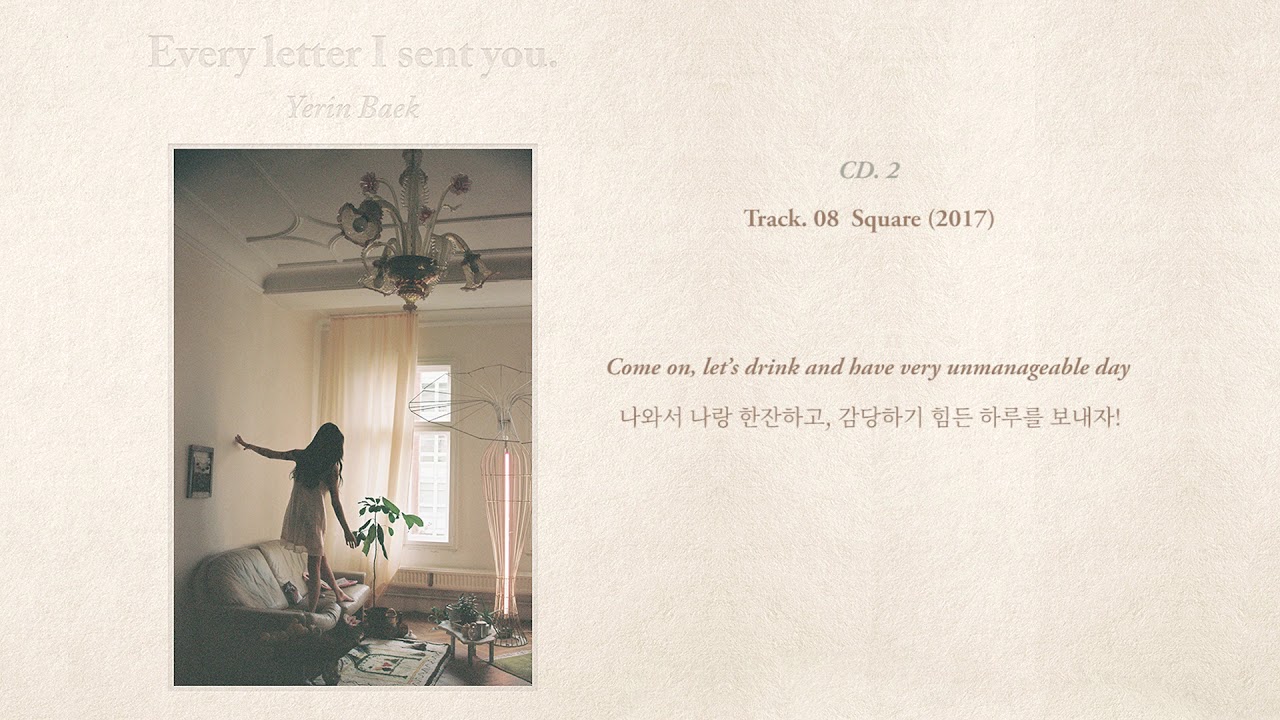
‘Bye bye my blue’나 ‘Love you on Christmas’ 등 싱글 앨범을 발표하며 백예린은 그 세계를 조금씩 그리고 단단하게 확장해 나갔다. 대중의 기대도 그만큼 응축되고 있었다. 백예린의 몽환적인 음색은 듣는 이의 감정을 건드리는 데에 특화돼 있었고, 그가 적어 내려가는 노랫말은 한없이 작아지는 모난 마음들을 위로했다. 그는 노래가 아닌 정서 그 자체로 소통하는 아티스트였다. 2019년 발매된 미니 앨범 2집 ‘Our love is great’은 축적된 그 모든 것들이 폭발한 듯한 앨범이었다. 영롱한 멜로디에 감정의 결이 섬세하게 어우러진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레게 리듬에 현악 편성으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구축한 ‘Our love is great’, 작은 것들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을 담은 ‘지켜줄게’ 등등 그가 만든 노래들은 별개의 곡이 아니라 감정의 결, 하나의 경험을 선사했다. 포근한 음색, 프로덕션의 완성도, 그가 가진 감정의 결이 엄청난 시너지를 냈다. 그 앨범이 많은 이들에게 스며들 수 있었던 이유다.
그 후 ‘Square’의 성공은 백예린이 아티스트로서 지닌 특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백예린은 분위기와 상황을 만드는 아티스트다. 바꿀 수도 있다. 결론부터 쓰자면 그렇다. 매섭게 불어오는 바람도 살랑거리는 봄바람으로, 분노하는 듯한 천둥, 번개도 하나의 무대 조명처럼 보이게 한다. ‘Every letter I sent you.’, ‘tellusboutyourself’까지 그만의 정서적 연출이 이어진다. 어떤 곡은 듣기만 해도 건조하고도 쓸쓸한 늦가을 거리 위에 서 있는 것 같았고, 어떤 곡은 주말의 늦은 오후 햇살을 쬐는 듯했다. 그의 음악은 감정이 머무는 공간에 가까웠다. 대중들도 백예린의 이름을 들으면 그런 맥락의 음악을 떠올렸다.

하나의 이름, 두 번의 탄생
누군가는 실험이라 하고 누군가는 모험이라 한다. 백예린의 새 앨범 ‘Flash and Core’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감정’, ‘감성’, ‘섬세’, ‘몽환’ 같은 단어들과 꼭 맞는 아티스트였다. 그가 해오던 음악들이 그랬기 때문이다. 간혹 ‘tellusboutyourself’에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곡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실험이라 일컬을 수는 없었다. 해오던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의 음색이 지문처럼 변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 무엇보다 그의 음악을 들으면 감상의 표출 방향은 언제나 내부를 향했다. 어떤 상황을 떠올린다거나 어떤 감정이 샘솟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러나 ‘Flash and Core’는 정반대다. 감상이 자연스레 외부로 표출된다.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춤을 추게 한다.
청자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프로덕션의 변화 덕분이다. 섬세하고 몽환적인 R&B가 아닌 드럼 앤 베이스, 펑크(funk), 힙합 등등 이전의 백예린 솔로 앨범에서 기대하지 않았을 법한 장르들이 마구 쏟아진다. 감성적으로 들리던 그의 음색이 도시적으로 새겨진다. 시종일관 존재감을 드러내는 베이스와 쿵쿵 뛰는 심장 소리를 듣는 듯한 드럼, 재지한 브라스까지 어우러져 펑크 사운드를 구축한 타이틀 곡 ‘MIRROR’는 우리를 댄스 플로어로 이끈다.
15곡이라는 작지 않은 볼륨의 앨범이 플레이되는 한 시간가량의 시간 동안 쉼 없이 달린다. 곡에 담긴 악기 구성 혹은 사운드 레이어 수와 곡에 들어가는 아티스트의 정성이 비례하는 게 아니란 건 알고 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미니멀한 사운드에 자신의 목소리만을 얹어도 완전한 곡을 발표할 수 있던 아티스트가 도전적으로 악기를 쌓고 곡 흐름에 변주를 준다면, 그렇게 새로운 장르에 자신의 몸을 내던진다면 이것은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기존의 라벨링을 떼는 행위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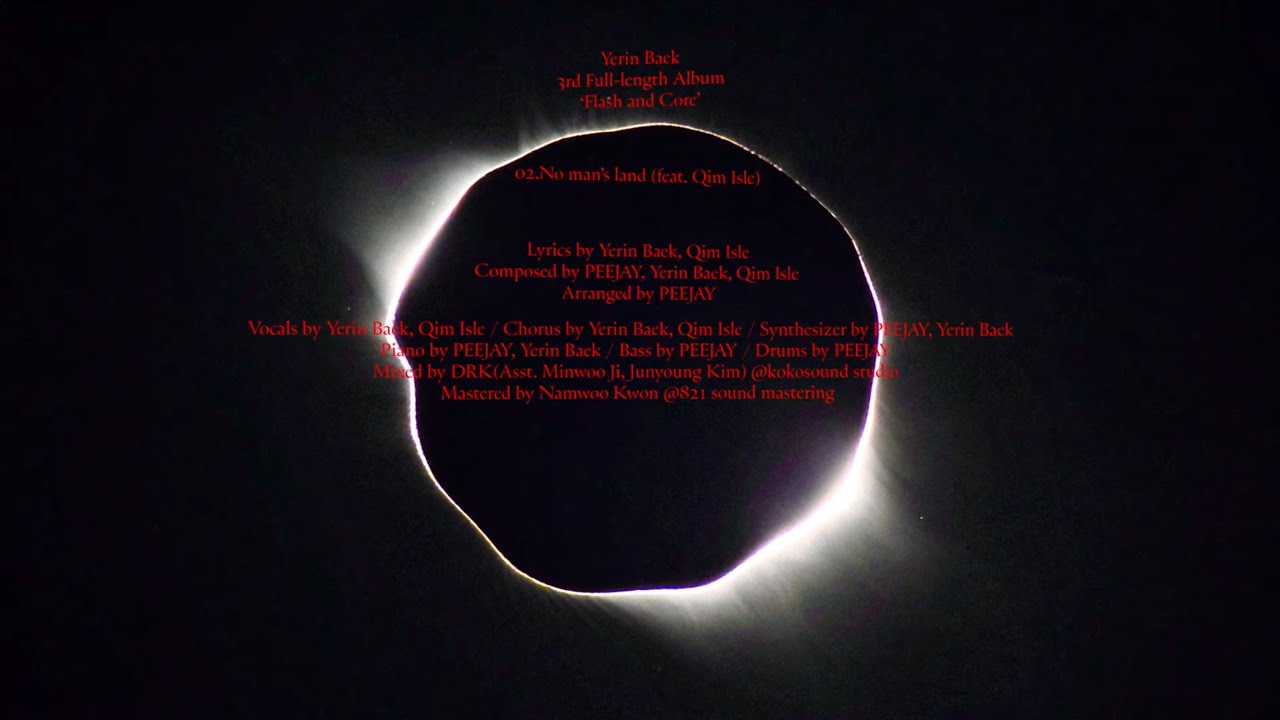
장르적 변화에 이어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백예린의 쓰임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의 음악은 종종 공간과 상황을 펼쳐 보이는 그림과 같았다. 프로덕션은 그림체, 음색은 색채였다. ‘Flash and Core’가 그리는 그림은 이전과 완전히 상반된다. 음색이 그림체처럼 역할한다. 백예린이 직접 곡의 구조가 된다. 악기 사운드에 함께 어우러져 음악 본연의 소리를 더 명확히 들려준다.
물론, 지금까지 언급한 프로덕션의 모든 변화를 프로듀서의 교체로 치환해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프로듀서의 교체는 단지 계기일 뿐이다. 그 안에서 ‘어떤 사운드로, 어떤 리듬으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지’를 선택한 건 백예린이라는 아티스트 자신이다. 그래서 이 앨범은 정갈하고 익숙한 서사에 새겨진 의도적 균열처럼 느껴진다. 오래도록 자신을 가두던 딱딱한 껍질을 찢고 나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백예린의 커리어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단절이 생기는 순간이 있다. 그러나 그 단절은 새로운 서사의 시작점이다. 그룹 활동에서 솔로 활동으로 넘어가던 때 새로운 우주를 쌓아 올린 것처럼. ‘Flash and Core’는 그가 스스로 과거의 세계를 찢고 새로 쌓아 올린 결과물이다. 익숙했던 감정의 언어를 내려놓고, 몸으로, 리듬으로, 프로덕션으로 말하기 시작한 순간. 이제 그는 자신의 음악 세계를 몇 번이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창조자이자 시스템으로 존재한다. 그것이 백예린의 메타모르포시스다.
- 비비, 자신을 끌어안은 이브2025.07.02
- ‘Ruby’, 제니라는 이름이 피워낸 공명2025.05.07
- 허윤진이 음악으로 그리는 사랑의 몽타주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