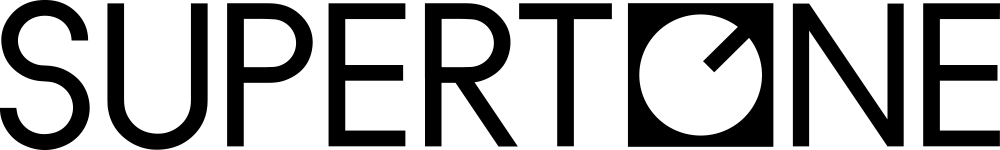
수많은 여성은 뛰어난 업적과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이 잊힌 존재로 남아 왔다. 20세기 초 영국 여성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셰익스피어에게 누이가 있었다면 셰익스피어만큼 대문호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여성들이 감수해야 했던 사회적 제약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 나아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행위는 단지 호명 그 자체에만 그치지 않는다. 개인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그 존재에 역사적 생명력을 부여하는 일이다.

제니는 지난 3월 7일 발매된 첫 번째 정규 앨범 ‘Ruby’를 통해 호명이라는 행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제니에게 호명은 증명 이상의 행위다. 존재를 뚜렷하게 내보이는 것을 넘어 듣는 이들과 공명하는 것이다. 앨범 인트로 다음에 곧장 이어지는 곡이 ‘like JENNIE’인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곡을 단순하게 해석하자면 전 세계를 배경으로 하나의 아이콘이 된 제니의 존재감을 재치 있게 드러내는 곡이다. “누가 제니랑 놀고 싶지? (Who wanna rock with jennie?)”나 “제니처럼 미치게 만드는 사람 있어? (Who else got ’em obsessed like JENNIE?)”라는, 자칫하면 오만해 보일 이 질문들이 가사인 것에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맹렬하게 으르렁거리는 듯한 비트에 압도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니는 ‘제니’가 어떤 인물인지 구체적인 묘사를 나열하며 특정하지 않는다. “AI가 따라 하지 못하는 스페셜 에디션 (Special edition and your AI couldn't copy)”이라거나 “값으로 매기지 못한다(I'm priceless)” 같은 비유적 표현은 규정될 수 없는 주체로서의 위치를 확립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계를 흐린 표현이기에 유동적인 ‘제니’를 만드는 전략이 되기도 한다. 외모에 대한 구체적 형상 대신 그 어떤 이미지도 담지 않음으로써 제니는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그 이름을 빌려 자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든다. 그렇게 ‘Like JENNIE’는 고유명사이면서 동시에 보편적 호명의 형식이 된다. 존재의 선언이자 가능성의 확장이다.

‘ZEN’은 또 다른 방식의 호명이다. 외부로 향하던 이름이 내부로 향했을 때의 호명. ‘ZEN’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 불교 수행법인 ‘선’을 뜻한다. 그래서 노래가 흐르는 내내 깨달음의 과정을 듣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은 자신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타파하고 배제하는 모습에 가깝다. 그러나 불교에 따르면 그 모습들마저 ‘나‘임을 아는 것,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는 “자정에 피는 꽃(midnight bloom)”이라는 가사를 통해 번뇌, 불안, 고민을 끌어안고 성장했음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었음을 표명한다. 수행의 끝에서 나를 괴롭혔던 것들조차 결국 ‘나‘ 자신이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다. “나는 선을 통해 끝까지 갈 거야 (I keep it Z, Zen)”라는 가사에서 ‘ZEN’은 단순한 도달점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한 ‘Jennie’의 또 다른 이름처럼 들린다. 사운드는 이 수행의 결을 따라간다. 몽롱하고 단단한 베이스가 곡의 중심을 잡고, 그 위에 제니가 내뱉는 노랫말이 듬성듬성 꽂힌다. 마치 여백의 미를 표현한 듯 절제된 멜로디는 제니가 가라앉아 생각하고 초월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감각적으로 증명한다. 그 여백 속에서 그의 이름은 되묻지 않아도 또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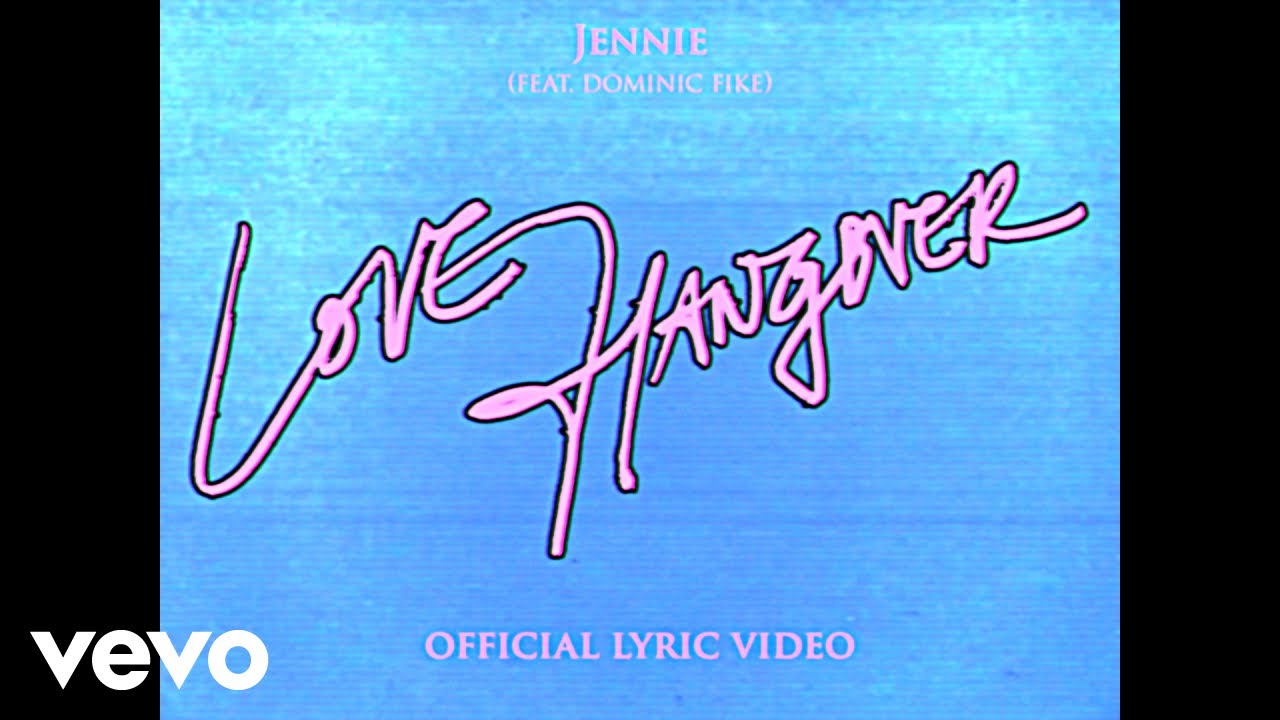
그러나 자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언제나 확신에 찬 선언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 이름은 감정 속에서 잊히고, 타인의 언어 속에서 흐려진다. ‘Love Hangover (feat. Dominic Fike)’와 ‘Twins’은 는 그 경계에 놓인 노래들이다. 제니는 이 두 곡을 통해 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나를 보여준다. 사랑에 취하고, 타인의 말에 나를 맡기는 순간들.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지도, 내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때의 호명은 명료한 자기 선언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조응하고 왜곡되는 비정형의 말 걸기다.
사운드 자체가 감정의 숙취처럼 들리는 ‘Love Hangover (feat. Dominic Fike)’에서 제니는 느슨하고 몽롱한 비트 위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마치 정체불명의 감정에 이끌리듯 노래한다. 몽글거리면서도 혼란스럽다. 말 대신 감정이 흐르고, 그 흐름은 자기 이름의 경계를 일시적으로 지워버린다. ‘Twin’의 감정은 오히려 확실하다. 깊은 후회와 아쉬움이다. 어쿠스틱 기타 리프가 주를 이루는 미니멀한 사운드에 읊조리는 듯한 제니의 보컬, 한 장의 편지를 읽는 듯한 가사는 어린 시절 친했던 친구를 떠올리게 한다. 이 곡에서 제니의 이름은 ‘Twin’이다. 그게 그 시절의 정체성이다. 곡 말미에 반복되는 “Twin”은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그때 그 친구를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앨범 속에서 표현된 ‘제니’라는 인물은 사랑에 무모하게 뛰어들고, 감정에 푹 빠지는 게 익숙한 인물에 가까운지도 모르겠다. 감정의 온도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당당히 제 이름을 부르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나’를 확인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호명은 연결이자 타인과의 유대다. ‘ExtraL (feat. Doechii)’과 ‘Mantra’에서 이는 더 또렷해진다. “우리 여자들이 무대를 지배해(Do my ladies run this)”라는 노랫말을 반복하며 주제를 강조하는 ’ExtraL’은 잘난 여자끼리 모여 만드는 무대, “큰 그림(Big Moves)”에 대해 말한다. 제니의 단단하면서도 유려한 보컬 퍼포먼스도 인상적이지만, 자신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등장하는 도이치(Doechii)는 이 곡의 또 다른 축을 만든다. 그가 날카롭게 꽂아 내리는 “난 남자들 눈치 볼 필요 없잖아. 그들과 타협할 생각도 없어(’'cause I’'m not here for pleasin’' the men Not here to reason with them)”라는 가사는 날이 선 해방감까지 선사한다.
뒤이어 등장하는 ‘Mantra’는 연대로 이어진 여성들에게 전하는 경전이다. 경전이라고 쓰니 조금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이 경전은 경쾌하다. “예쁜 여자들의 철칙(Pretty-girl mantra)”이라 이름 지어진 이 경전에는 외형적 ‘pretty’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닌 여성 연대가 쓰여 있다. 상처에 휩쓸리지 않기, 당당하기, 여자들을 지키기 등등. 어떤 여성이든 자신만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행동 철칙들은 후킹한 사운드와 반복되는 후렴 위에 얹어져 여성들이 함께 공명하는 목소리가 된다.

‘Ruby’는 제니라는 아티스트가 현재 음악계에서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증명하는 앨범이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넣은 가사로 보기 드문 자신감이 담긴 문장을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의 듣는 이들을 열광시키는 지금, 우리는 하나의 팝 아이콘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설득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
‘제니’라는 이름은 역사적 생명력을 안고 격동한다. 그 이름은 하나의 고유명사이면서 동시에 어떤 상태로 확장되기도 한다. 자신을 두려움 없이 드러내고, 이름을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상태. 제니는 바로 그 힘으로 리스너들과 공명한다. 노래를 따라 부르는 순간, 누구든 제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제니는 어디에든 존재한다.

- 허윤진이 음악으로 그리는 사랑의 몽타주2025.02.14
- 도이치, 새로운 힙합 마돈나2025.02.07
- 시저,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다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