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운드 오브 뮤직 pt.1’의 타이틀 곡 ‘사랑의이름으로! (feat. 카리나 of aespa)’의 후반에는 흥미로운 구석이 하나 있다. 마지막 후렴으로 향하는 길목, 최정훈과 아기자기하게 목소리를 맞춘 카리나가 “사랑의 이름으로…”라 흥얼거리자, 경쾌한 타건의 피아노와 김도형이 연주하는 전기 기타 솔로가 8마디씩 이어 붙여진다. 이 구간에서는 각각의 악기 소리가 아바를 닮아 가볍고 서정적이라는 점과 브라이언 메이를 닮아 명확하고 고전적이라는 점이 대비된다.
물론 특징적인 음색을 암시하는 인용법은 잔나비가 지난 두 음반에서 열심히 실행한 일이기도 하다. 복기하자면 2019년에 발매된 2집 ‘전설’은 1980~90년대의 세련된 한국 가요를, 2021년에 발매된 3집 ‘환상의 나라’는 1960~70년대의 웅장한 영미 록을 지향하고 있었다. 두 영역을 묶어주는 상위에는 백과사전으로서의 팝, 한 세기가 족히 넘는 기간 동안 세계 곳곳의 수많은 청자를 다양하게 매혹해온 온갖 음향 마술의 총서가 있다. 그 모범적인 독자인 잔나비가, 가장 널리 통용되는 두 재료를 골라와 ‘사랑의이름으로!’가 끝나가는 길목에 예쁘게 덧붙인 셈이다.

‘사운드 오브 뮤직’은 특정한 음색으로 이뤄진 참조 문헌과 인용구들로 가득하다. 그 목록에서 전작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우선 참조 및 인용 범위가 20세기 하반기의 팝 정전 전반으로 넓어졌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pt.1’을 본격적으로 여는 ‘FLASH’부터 (맥시멀한 관현악 편성 중심의 전작들에 비해 현대적일) 1990년대식 얼터너티브 댄스풍의 비트와 턴테이블 스크래치, 오버드라이브 걸린 기타 톤이 불쑥 들어오고, ‘Juno! 무지개 좌표를 알려줘!’는 곡명에도 쓰였듯 1980년대 팝 사운드에서 큰 몫을 차지할 롤랜드사의 주노 신시사이저의 음색을 드럼 머신과 전기 기타의 톤과 합친다. 잭 케루악과 뉴욕 시티를 청춘과 엮어 호명하는 ‘pt.2’로 넓히자면, 1950년대 보컬 그룹과 라운지 음악의 달콤 발랄한 리듬이 4집 전반에 깔려 있기도 하다.
‘pt.1’의 작업기에서 밝혔듯, “노스탤지어 박물관, 사운드들의 콜라주”라 할 수 있을 만한 ‘사운드 오브 뮤직’의 음향은 잔나비가 열심히 수집한 빈티지 악기와 장비 등을 활용하는 실물 샘플링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완성된 음반은 그들이 충실히 애호하는 사물들을 꼼꼼히 조합해 팝의 반 세기짜리 과거가 한꺼번에 울려 퍼지는 인공물들로 빼곡히 채워진 박물관이자 백과사전처럼 들린다. 그렇기에 여기서 정말로 흥미로운 것은 시시각각 또 이곳저곳에서 끌어온 참조와 인용 대상이 어떻게 하나의 음향으로 합쳐지는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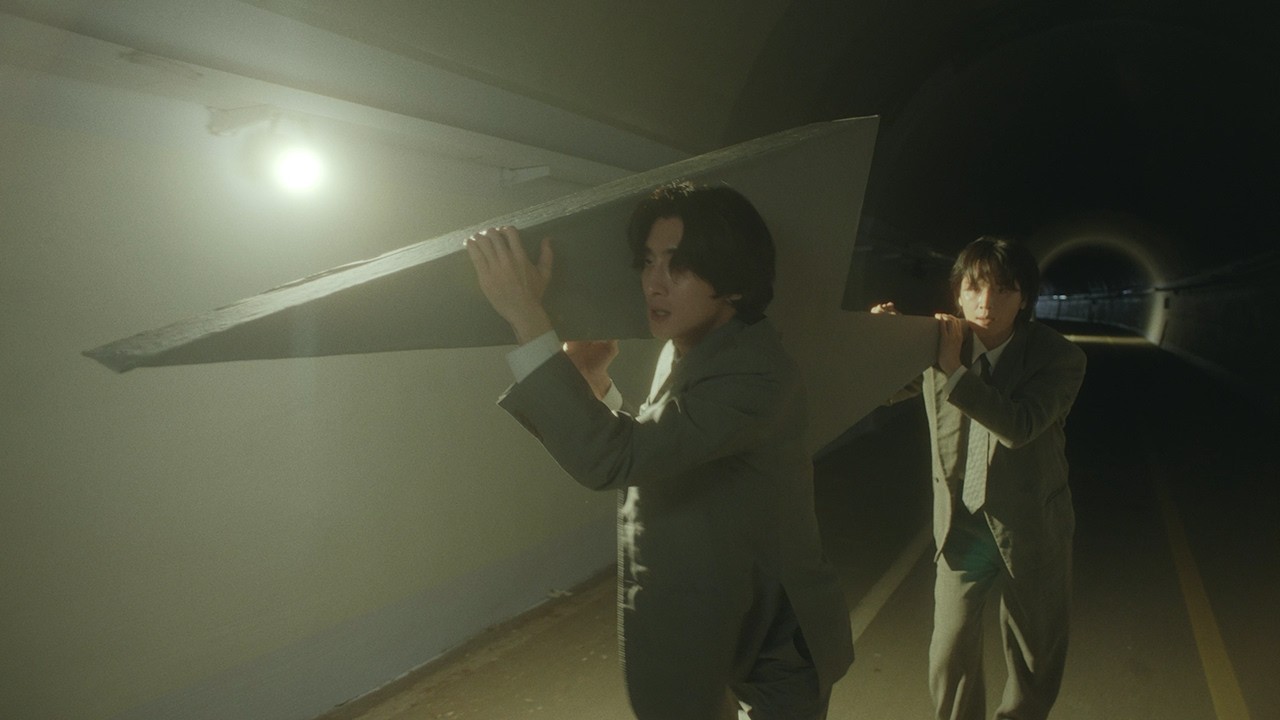
이 즈음에서 ‘사랑의이름으로!’의 솔로 구간에 돌아가 보자. 여기서 각 소절은 그저 이어지지 않고 전자음과 관현악기로 덩어리진 소리가 몰려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식으로 이행한다. 비유하자면 “여름밤 차력 쇼를 위한 TV 광고”를 돌리기보다, 마치 꿈이라도 꾸든가 아니면 그런 꿈을 주마등 같게 연출하듯이 말이다. 다시금, 그렇게 듣자면 ‘사운드 오브 뮤직’은 잔나비가 수집한 재료들만큼 이들을 한 덩이로 이어 붙이는 접착제 같은 소리로도 가득하다.
주요 구성 요소에 확실히 속하지 않으면서도 음향 전반에 쌓인 이러한 잔여물들이야말로 잔나비가 귀로 탐독해온 고전들을 어떻게 끌어와 쓰는지를, 그들이 ‘팝’을 어떻게 자습서이자 참고서처럼 어떻게 공부해왔는지를 들려준다. 이들에게 1980~90년대 한국 가요란 그저 풍문으로 전해져 내려올 뿐인 ‘전설’에, 1960~70년대 영미 록이란 방문할 수 없어 감히 상상만 할 수 있는 ‘환상의 나라’에 가깝듯, 잔나비가 직접 공수한 옛 수집품들을 활용해 구현하는 팝이란 그들이 매혹된 수많은 세부 사항을 인공적으로 짜맞춘 꿈과도 같다. “수많은 기계 장비들 사이에서 낭만주의 시대에 입었을 법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대착오를 얼마든 믿고 따를 수 있고, 각기 다른 시간대가 얼마든 이상적으로 합쳐질 수 있는 꿈과 전설과 환상의 세계.

‘pt.1’의 “만화적인 우주”에 비해 “실사의 땅”으로 비유되는 ‘pt.2’에서도 여전히 부유감이 느껴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사실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구석이 여기에 있다. 어쿠스틱한 포크 계열의 편성과 자전적인 일상에서 영감을 받은 노랫말 등을 통해 ‘현실적인’ 주제를 지향함에도, 전작들에서 동원한 꿈결 같은 코러스와 관현악이 후경에 은근히 깔린 채 위력을 발휘하니까. ‘pt.2’를 여는 ‘어스’는 직전까지의 백일몽에서 깨어나듯 “일어나”라는 첫마디와 하품 소리로 시작하지만, 2절로 진입하면서 실재감이 느껴지도록 하는 앰비언스를 제거하며 다시 꿈의 세계로 진입한다. 트랙 후반부에서는 ‘FLASH’에서 들을 수 있던 다양한 소리 수집품들의 연쇄가 더욱 주마등처럼 반복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를 아무리 현실에 발을 디디려 해도 지상에마저 두껍게 깔린 꿈과 전설과 환상의 소리 또 아무리 현재에 머무르려 해도 끊임없이 힘을 발휘하는 과거의 소리로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지구 겉면의 땅도 결국 별이 빛나는 우주에 둘러싸여 있듯, 잔나비가 겪는 현실에는 그들이 추구하고 제작한 꿈과 전설과 환상이 스며들어 있다. 거기서 시간은 양희은이 청춘의 목소리를, 이수현이 엄마의 목소리를 내듯 선형적이기보다 여전히 뒤엉켜 있다. ‘pt.1’에는 없었던 부제가 이르듯 ‘pt.2’가 지향하는 현세의 ‘삶’은 지금의 경험보다 도리어 청소년기에 대한 추억과 나이듦으로 가정되는 회고, 이를 통해 언제나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사적인 과거들로 채워져 있다. 그 또한 잔나비가 전작에서 공들여 제작한 공적인 과거와 깔끔히 분리할 수 없는 모양새, 즉 화려한 편성과 장식음과 음향 효과의 꼴로 뒤섞여 있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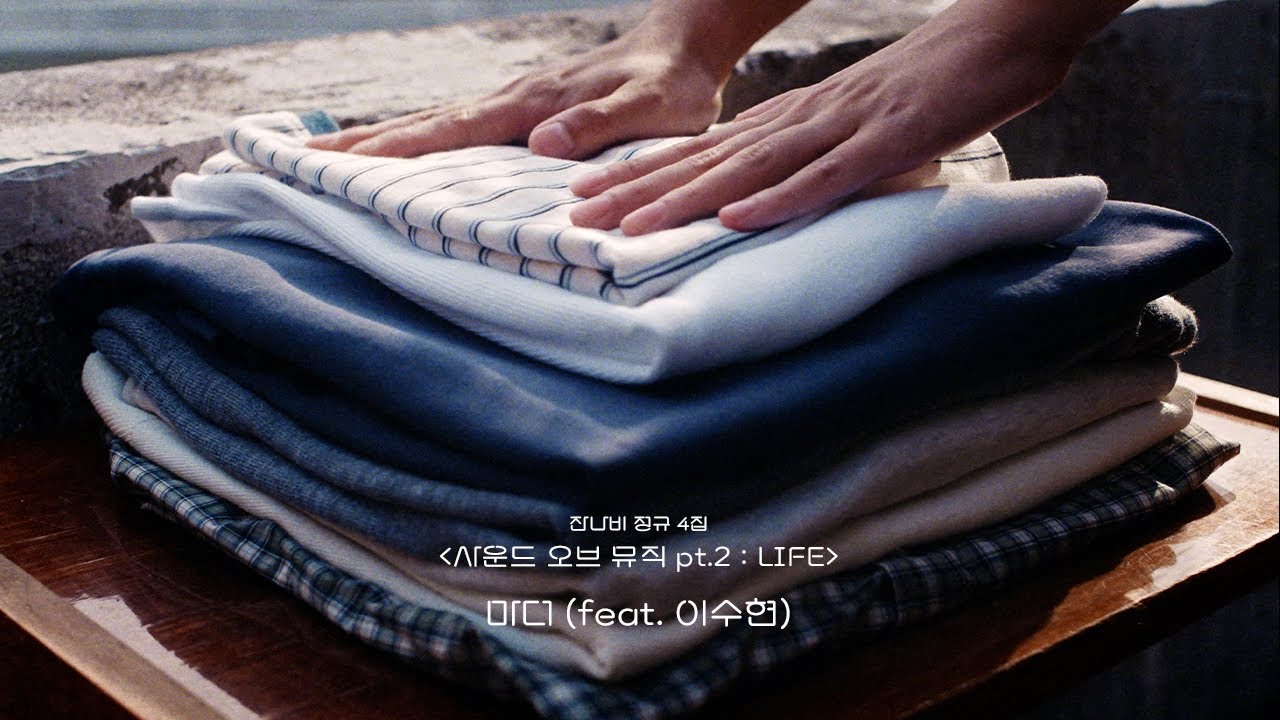
이런 사적인 기억에 이어 ‘사운드 오브 뮤직 pt.2’에서 두드러지는 참조와 인용 대상은 과거의 팝 사운드보다 현재의 잔나비 그 자체이기도 하다. 애초에 스킷이 “자기 브랜드화된 잔나비식 여름과 환상에 대한 셀프 패러디”로 설명되거나 “번갯불콩대작전”이라고 불릴 만큼 생산적으로 신곡을 뽑는 와중에도 오래된 미발표곡이 실린 게 그러하듯이. 다시금 ‘pt.1’까지 넓혀 듣자면, 전작의 흔적들은 ‘모든 소년 소녀들1: 버드맨’에서 그렇듯 노랫말 군데군데에 참조 문헌과 인용구의 모습으로 숨겨져 있다. 이러한 자기 반영성은 잔나비가 20세기 하반기의 팝에 대해서 그러했듯, 마치 자신들의 역사를 기념하는 콜라주 박물관을 똑같은 방식으로 세운 것처럼 들린다. 이곳에서는 오래된 팝이라는 공적인 과거와 이를 되새기고 기리는 잔나비의 사적인 과거는 서로에게 뒤섞여 있다.
‘pt.2’의 작업기에서 4집을 “끝이자 시작”이라고 밝혔듯, ‘사운드 오브 뮤직’은 잔나비가 그동안 만들어온 모든 시간을 종합 결산하는 현장이다. 복각 대상이 나름 분명했던 전작들과 달리, 이번 음반은 여태까지의 잔나비를 구성한 각종 음향과 시대가 균질적이지 않게 혼재되었기에 그들의 경력상에서도 퍽 재미난 위치에 놓인다. 오랫동안 모아온 수많은 과거 조각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자신이 꿈의 세계를 수놓은 음악 소리, ‘사운드 오브 뮤직’에 아직도 매혹되어 있다고 밝힌다. 만약 잔나비가 이토록 애호하는 팝 음악과 그로 이뤄진 자기 자신을 오직 “사랑의 이름으로” 구체화하는 것에 성공했다면, 우주 같은 꿈에서 현실의 땅으로 내려오려는 지금에는 그 왕성한 수집욕이 언제 어디로 또 어떻게 향할까?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사랑의이름으로!’에 돌아가볼 수 있겠다. 솔로 구간들이 끝나고, 최후의 후렴 사이에 흥겨운 1950년대 팝풍의 리듬과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코러스에 실려 “이 시절을 기억해! 그리 길진 못할 거야!”라는 어구가 삽입된다. 달콤한 사랑 노래에 불청객처럼 끼어든 이 구절은 “이 시대는 내겐 아직 어지러워”라는 노랫말까지 더하자면 제법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어지러운 현실에서 닻을 올리게 하는 이 “낭만적인” 시절은 좋은 팝이 한 세기 넘게 제공한 매혹적인 꿈의 세계에서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이제 땅 위에 선 채 저 멀리 우주를 바라보며, 지금의 잔나비는 이를 셈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 백예린의 메타모르포시스2025.10.28
- 송소희가 'Not a Dream'으로 제시한 세계2025.03.13
- ‘Poet | Artist’, 샤이니의 시적 허용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