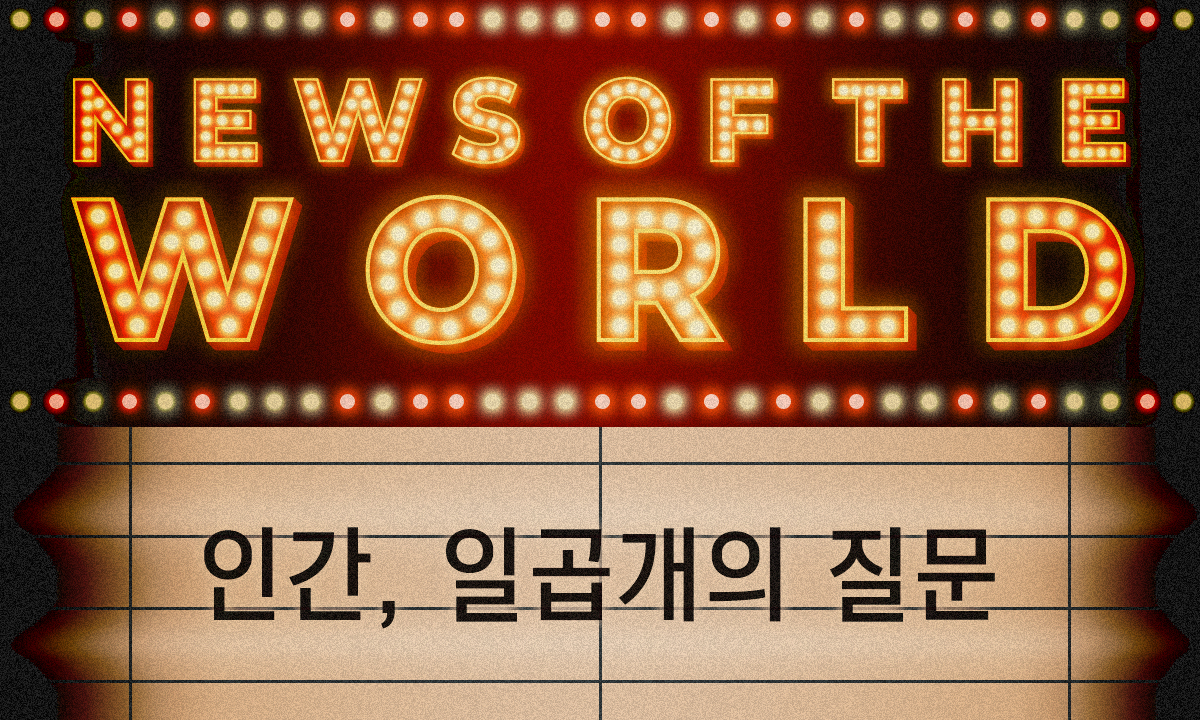
이건희 컬렉션으로 올해 큰 화제가 되었던 삼성의 리움미술관이 지난 10월 8일, 4년 만의 기획전 ‘인간, 일곱개의 질문’으로 재개관을 알려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년 7개월간 휴관을 해오던 리움미술관은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 장 누벨, 렘 쿨하스 3명이 건축 설계를 맡았으며, 고미술부터 동시대의 미술까지 폭넓고 방대한 양의 소장품으로써 국내 최대의 사립 미술관으로 자리 잡았다. 50여 명의 작가와 130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 대해 주최 측은, 21세기 급변하는 환경과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의 의미를 재고함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가늠을 시도한다고 소개한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대주제에 관한 7개의 질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이 시대의 구성원 존재와 관계를 사유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울 보기’ 챕터에서는 현 시대 인간에 대한 사유를 다루고 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증명되는 우리의 유한성은, 그동안의 인간 역사에 대해 돌아보고 앞으로의 세계에서 우리가 타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게 만든다. 미술관의 전시 소개 영상이나 관람객들의 인증 사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표적 작품으로 론 뮤익의 ‘Mask Ⅱ’가 등장하는 것도 그러한 우리 삶의 깊이를 피부로 느끼게 되는 까닭일 것이다.
이어지는 2관과 3관은 ‘펼쳐진 몸’과 ‘일그러진 몸’을 통해 현대미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몸에 대한 담론을 다룬다. 직접적으로 삶과 세상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몸은 21세기에 들어서 핵심적인 표현 수단이 되었다. 이를 통해 예술에서의 행위는 그동안 억압되어 왔던 요소들을 드러낸다. 반면에 ‘일그러진 몸’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비이성적 그림자를 조명한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전쟁과 폭력, 죽음의 이미지는 우리의 변종적 형태로 나타나며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4관과 5관의 ‘모두의 방’과 ‘다치기 쉬운 우리’에서 그 방향 모색에 대한 시도를 찾아볼 수 있을 듯하다. 요즘의 우리에게 주요하게 다가오는 혐오와 편견, 차별의 문제를 다루며 이에 대한 저항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통해 마주하는 문제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예술로 평등을 갈망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되는 현실에서 관계의 극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의 시각은 단순히 인간의 관계를 생각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는다.
6관과 7관의 주제인 ‘초월 열망’과 ‘낯선 공생’에서는 미래 지향적 우리 삶의 태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시대에 이르렀지만, 인공물이 인간을 대체하는 현실 속에서 변해가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인간만의,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들과 공생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요구받는다. 다양한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새로운 생태계를 제안하려는 시도는 전시장 안의 주제를 넘어, 새로운 공동체를 이야기한 장 뤽 낭시나 사회의 모든 관계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 브뤼노 라투르와 같은 이 시대 지성들의 철학적 사유와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번 전시는 단지 인간만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인간다움을 재고하게 만들어 과거의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며, 수평적 관계의 시대를 지향하는 예술로 몰입시킨다. 그리하여 단일한 종으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남을 것이다.
-
 ©️ Leeum Museum of Art
©️ Leeum Museum of Art
TRIVIA
론 뮤익(Ron Mueck)
호주 출신의 하이퍼리얼리즘 조각가로, 그의 작품은 섬세한 인체 표현을 통해 인간 삶과 죽음을 주제로 우리의 근원적 고찰을 담아낸다. 실제 같은 묘사지만 실제와 다른 스케일을 통해 우리는 거울 속의 낯선 이미지를 발견한 것처럼 객관화된 우리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oW] 앤디 워홀에게 가는 파티장2021.0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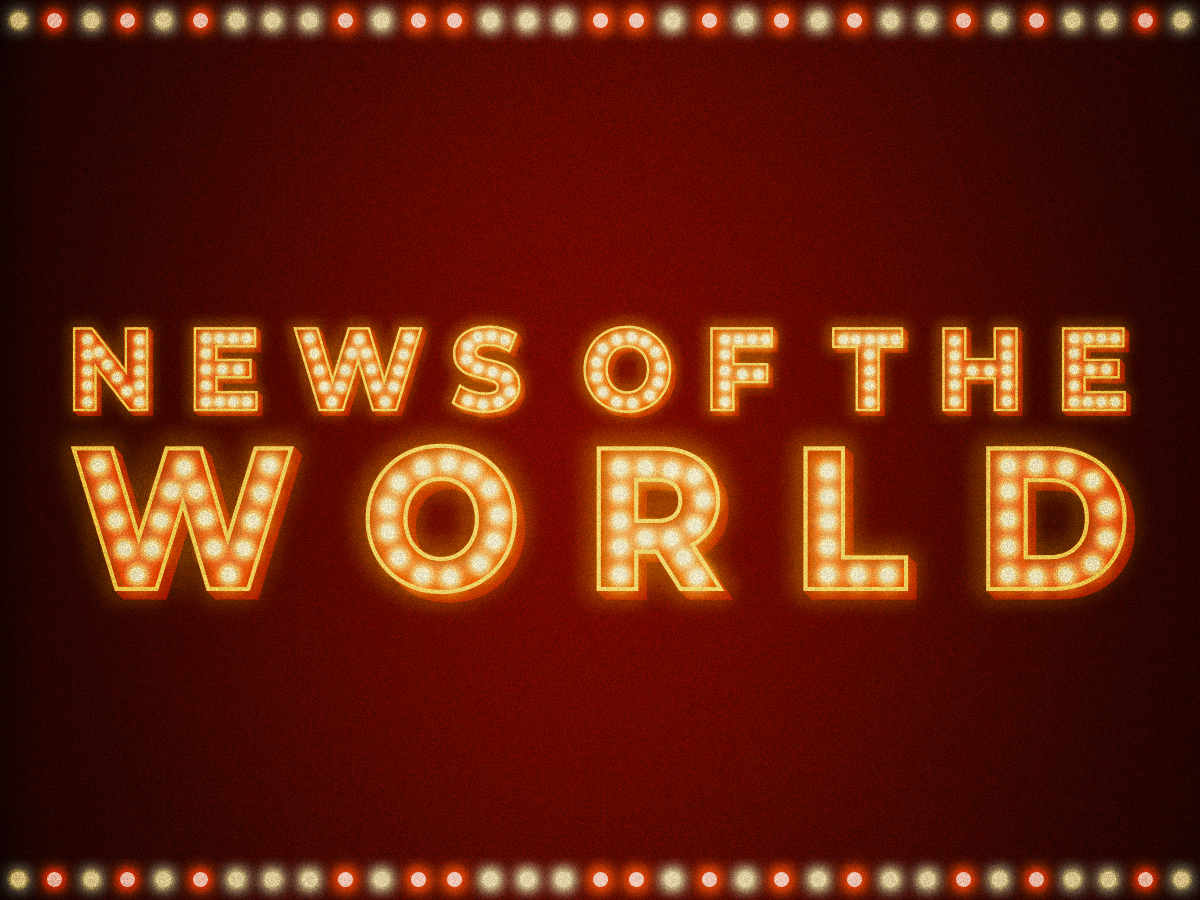
- [NoW] 이불 : 시작2021.05.07

- [NoW] 피카소의 영원한 열정2021.06.04

- [NoW] 리히터의 색과 빛2021.07.02

- [NoW] 뱅크시의 자유, 평화, 정의2021.07.30

- [NoW]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웰컴 홈 향연2021.08.27

- [NoW] 앨리스 달튼 브라운2021.09.24

- [NoW] 살바도르 달리,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2021.10.22
